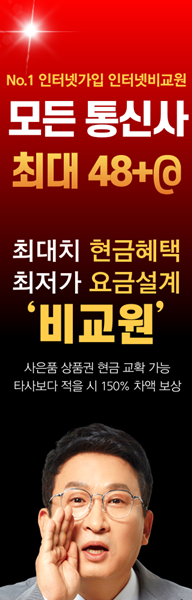프랑수와 트뤼포 : 화씨 451(1966)
원래 400번의 구타를 보려다가, 451이 숫자가 더 높아서 이것을 먼저 보았다.(헤헷)
내가 봤던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영화의 계보를 잇는 영화인데
[1984], [브라질]과 유사하면서도 또한 색다르다.
위에서 내가 저 오프닝 장면들을 캡쳐한 이유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래이션으로 감독이 누구고, 편집을 누가했고, 미술, 음향 등이 누구인지 일일이 말해준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은 미래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책(book)'을 모두 불태우는 제도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문자를 통한 정보소통을 금기시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오프닝 또한 정보를 음성언어로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 영화제목이 나오지도 않고
등장인물들은 모두 만화(그림)로만 된 신문을 읽고, 하루종일 TV만 보는 걸로 나온다.

어 씨발 [쥴앤짐]의 쥴이 아닌가? 너 씨발 혼자 살아남았다고 이젠 책을 불태우고 다니니?

TV에서는 하루종일 이 여자가 나와서 모든 정보(오늘은 책을 얼마나 불태웠는지 등)를 말로 알려준다.
빅 브라더가 아니라 빅 시스터 아니겠盧?
영화 중간에도 나오지만, 소설은 거짓된 삶을 다룬다는 이유로, 철학은 헛소리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태움
실제로 이상국가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술을 혐오했지.
플라톤은 [국가]에서 시인(즉 예술가)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했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는
아예 예술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르크스 식으로 말하자면 종교와 더불어 "예술은 인민의 아편"인 셈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소규모 공동체들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책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어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를 책 이름으로
부르며,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암송'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통째로 넘겨주는 식이다.

기술과 문명은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류의 지적 수준은,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고대 문명의 수준으로
퇴보한다. 소쉬르의 언어학과 구조주의의 개념을 빌려본다면, 이제 이들에게 남은건 빠롤(발성언어)뿐이고,
랑그(언어 체계)는 소실될 위기에 처한다. 이는 인간의 소통, 나아가 인류 존재의 정체성까지 위협받는다.
전체주의를 다루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듯이, 정부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상과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인류의 존재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철학'과 '예술'을 강조한다.
'철학', '예술', '종교'는 문명 그 자체이며,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본질은 '물질문명'이 아닌, '정신문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암튼 누벨바그 영화보기라고는 했지만, 이 영화가 누벨바그에 속하는 지는 모르겠다.
그냥 감독이 트뤼포라서 보긴 했는데 누벨바그를 떠나서, 영화 자체로 많은 감동을 준다.
다음으로는 고다르의 [알파빌]을 보려고 한다.
잡소리가 길었는데 또 민주화 먹겠노........
추신)
이건 내 생각인데 말야, 과거의 영화에서 먼 미래를 배경으로 다룰 때, 그 중간에 낀 현재의 우리가
그 영화를 감상하면 존나 재미있어. 왜냐하면 당시 과거의 기술적 한계 내에서 미래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니깐 나름대로 존나 상상력을 발휘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현재의 우리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서 기발한 상상력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 그런 류의 대표적인 장르가 스팀펑크 아니겠노?
전기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별의별 장치를 다 동원해서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전기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증기기관을 하찮게 보면서도, 또한 그 상상력에 감탄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