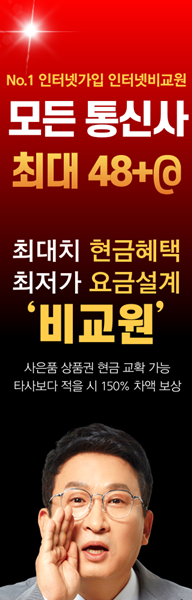항상 말하듯이, 예전부터 [인셉션]의 결말에 대해서 감독에게 정답을 확실히 정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데에 충격을 받고,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트겐슈타인의 선집 [문화와 가치] 중에서 글을 몇 개 골라봤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것만큼 좋은 어떤 것을 예술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MS 156a 57r: 1932~1934 무렵
이는 내가 얼마전에 썼던 니체의 글과도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입을 열 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2-140>
여기는 영게니깐 영화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영화는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다큐멘터리'와 구별된다.
또한 우리를 계몽시키거나 활동을 촉구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광고'도 아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세계를 보는 눈을 넓혀주고, 우리의 감정을 웃거나 울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비평가(평론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즉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비평가가 영화에 대해서 정답을 규정지으려한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욕심이고, 예술을 제대로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해답을 찾아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거부하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상적 정확성이란 개념이다.
정확성이라는 우리의 이상은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최고의 이상이 아니다. MS 162b 69v: 1940.8.19
칸트 식으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선험적 직관형식'을 예로 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의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누가 서로 옳다느니 그르다느니 하는 문제가지고 싸우는 것은 정말 한심한 짓이다.
꼭 이런 씨네필이 있지.
"47분 39초에 보면 주인공의 왼손에 무엇이 들려있다. 근데 17초 후 아주 잠깐 스쳐가는 장면에서는 그게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이를 통해 결말은 ~~~ 이러하다."
물론 논리적 정합성에 의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상당부분 논리적 비약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그게 감독의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니와, 감독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했다면 아주 잠깐 스쳐가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네필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비싼 영화값 내고 그 장면만 유심히 찾아보려 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 또한 마틴 스콜세지의 [코미디의 왕]의 결말이 현실인지 꿈인지에 대해서는(이정도는 스포도 아님), 인간의 본성인 호기심이 유발될 때도 있으나,
이성의 힘으로 끝내 억누르고 오히려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나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코미디의 왕]의 결말만 생각하면 아직도 담배가 다 타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흠뻑 취하곤 한다.
물론 인간 본성의 '호기심'을 갖는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나와는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적는다.
끊임없이 ‘어째서’라고 묻는 사람들은, 어떤 건축물 앞에 서서 베데커(독일 출판사의 유명한 여행 가이드북)를 읽으며,
그 발생사 등등을 읽느라고 그 건축물은 보지 못하는 관광객들과 비슷하다. MS 124 93: 19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