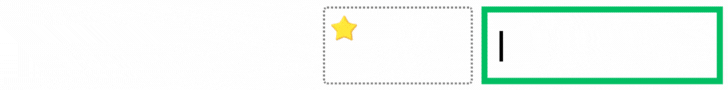작은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다
소년은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한 마디를 잃었다
기계에 잠시 정신을 빼앗긴 사이였다
상처는 아팠지만 의사는 말했다
조심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을 거예요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소년이 손에 붕대를 감고 마을 골목을 지나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꺼냈다
《저 손 봤어? 벌써부터 사고 치네》
《그러니까 저런 애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저 집은 누가 먹여 살리냐? 벌써부터 쓸모가 없는데》
그 말들은 바람에 실려 온 마른 먼지처럼
소년의 귀와 가슴 속에 자꾸 쌓였다
소년의 상처는 한 군데였지만
그 말들은 몸 구석구석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산 위에 사는 늙은 목수 할아버지가 소년을 불렀다
「손이 많이 아프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파요. 근데… 손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아파요
전 이제 다 망가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준을 데리고 오래된 공방으로 데려갔다
공방 안에는 깎다 만 나무판, 금이 간 의자
비틀어진 문틀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이거들 전부 망가진 거죠?」
소년이 묻자 할아버지가 웃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잘 들어보렴.」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껍질이 여기저기 벗겨진
나무토막 하나를 가져왔다
군데군데 벌레가 먹은 자국도 칼로 잘못 그은 흠집도 있었다
《이 나무는 원래 숲에서 가장 곧고 튼튼하다고》
《소문난 나무였단다 그런데 어느 날 번개를 맞고》
《껍질이 다 타버렸지 숲의 다른 나무들은 말했다》
이제 저 나무는 끝이야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겠지
소년은 나무토막을 들여다보았다
겉은 거칠고 흉했지만 잘려진 단면은 단단하고
단심이 고르게 퍼져 있었다
근데요, 할아버지. 그럼 진짜로 쓸모가 없어진 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무토막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번개가 이 나무를 부러뜨리진 못했다 다만 상처를 남겼지
그런데 숲의 다른 나무들이 ‘넌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이 나무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단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는 약해 하고 떨었고
작은 새가 올라타도 ‘언젠가 꼭 부러질 거야’ 하고
버텨 보려 하지 않았어
소년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결국 부러졌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번개도 바람도 새도 이 나무를 부러뜨리진 못했어
하지만 이 나무는 평생 자기 힘을 믿지 못한 채
숲 속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를 스스로 골라 서 있었단다
다른 나무들이 그를 망가졌다고 부르며 내버려둔 탓에
이 나무는 자신이 정말로 망가진 줄 알고 살아버렸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평생 제대로 피지도 못한 거야
소년이 들고 있던 나무토막이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말이야 네 책상을 지탱할 다리가 될 거다
번개도 버틴 나무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쯤은 거뜬히 버티겠어
겉모습이 어떻든 속이 멀쩡한 걸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나무는 다시 자기 일을 할 수 있어
그 말에 소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하나가 비어 있는 자리에서
약간의 시릿한 느낌이 퍼져 나왔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나머지 손가락들은
여전히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날 망가뜨린 건 기계가 아니고, 사람들 말인 거네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은 몸을 상하게 할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냉혹한 말은 마음에 칼을 꽂지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는 끝났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벌어진단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 상처 입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그 상처는 순식간에 말기 병처럼 번져 버려
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말이 번갯불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 번쩍였다 사라지지만
나무껍질을 통째로 태울 만큼의 열을 가진 번개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전 계속 망가진 기분일 텐데.」
할아버지는 공방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옷걸이를 가리켰다
군데군데 갈라지고 금이 갔지만 코트와 모자를 여러 벌 걸고
여전히 묵묵히 서 있는 나무 옷걸이였다
「저 옷걸이도, 처음 나왔을 땐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지.
‘왜 이렇게 삐딱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무는 조금씩 흔들렸단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말해 주었어
‘넌 삐딱해서 더 많은 옷을 걸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나무는 비로소 자기 모양으로 서 있을 용기를 얻었지.」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코끝으로 나무와 톱밥, 오래된 먼지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너를 망가뜨리는 건 기계도 사고도, 상처도 아니란다
넌 끝났다 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혀지
그리고 그 말들을 진짜라고 믿어 버리는 너 자신이기도 하고
세상 모두가 널 도태됐다고 불러도
네가 스스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넌 아직 쓰일 데가 많은 나무와 같단다.」
소년은 손에 감긴 붕대를 꽉 쥐었다.
아픈 손가락 자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손 전체가 마비된 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내민 연필을 쥐어 보니
서툴지만 글씨도 쓸 수 있었고 못을 잡는 것도 가능했다
그날 저녁, 준이 골목을 다시 걸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
「저 애가 그 애야.」
「앞으로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
그 말들이 다시 날아와 소년의 귀를 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소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당신들 눈에는 내가 번개 맞은 나무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속이 썩었다고, 누가 확인이라도 했나?
집에 돌아온 소년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벗겨진 나무토막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누가 보기엔 그저 못생기고 상처투성이인
나무 조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하나의 약속 같았다
언젠가 자기 손으로 이 나무를 깎아
책상을 지탱하는 다리로 만들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책상 위에서
자신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써 내려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긴 순간, 이상하게도 손가락 끝의
통증이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준의 방 안에서는
톱밥 냄새와 함께 조용히 나무를 깎는 소리만이 들렸다
나무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였고 준의 손 역시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말 대신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을 나누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마을 사람들은 아마도 말할 것이다.
「손가락 하나 없는 주제에, 저렇게까지 버티네.」
「그래도 쓸 데가 조금은 있나 보지.」
그 말은 여전히 거칠고 싸늘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소년은 알게 될 것이다.
진짜로 자신을 지탱해 주는 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상처 입은 손으로도 계속 깎아 나간 나무의 감촉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아이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소년은 이렇게 말해 줄 것이다
「너를 망가뜨리는 건 네 상처가 아니야.
그 상처를 향해 던져지는 냉혹한 말들
그리고 그 말을 네 진짜 모습이라고 믿어 버리는 마음이지
그러니 네 안의 나무를 먼저 믿어 줘
겉껍질이 벗겨졌다고 나무가 끝난 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작은 아이가
벗겨진 나무토막을 손에 쥐고 돌아갈 때
마을 어딘가에서는 또
누군가를 향한 날 선 말들이 떠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히
상처 입은 나무 몇 그루가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을 것이다.
그게 이 마을에서
고통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는
작고도 단단한 비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