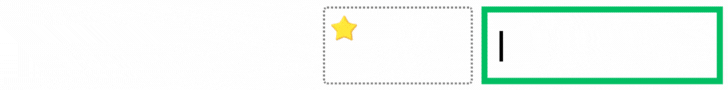내가 분노하는 지점은 '감정'이 아니라 '질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즘 너무 또렷하게 들린다.

이번에 정동영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이 새끼가 어느 나라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무인기 사건을 두고 “평온한 일상이 흔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북한이 아니라 남쪽 내부로 몰아 붙였다. 민간인, 군인, 국정원 직원까지 싸잡아 “일반이적죄”를 뒤집에 씌운 순간, 이건 평화 발언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을 선언한 언사이다. 즉, 적은 바깥에 있는데 범죄자는 안에서 만들겠다는 신호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말이다. 이 표현은 듣기엔 그럴듯 하지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다.

적대행위는 북한이 수십 년간 일상처럼 해온 짓이다. 천안함 격침, 미사일 발사, 핵 위협, 오물풍선, 드론 침투. 이 모든 건 늘 북쪽에서 시작됐다. 그런데도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은 단 하나다. 우리만 멈추란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합의는 우리가 먼저 어긴 적이 없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깨뜨렸고,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럼에도 복원을 말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지우고 “쌍방 책임”이라는 안락한 말장난으로 현실을 덮겠다는 뜻이다. 그 결과는 뻔하다. 북한은 계속 쏘고 날리고 위협하고, 우리는 대응할수록 ‘평화를 해치는 쪽’이 된다.

이적죄(利敵罪)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쉽게 튀어나오는지도 봐야 한다. 군과 국정원의 대북 활동을 이적 프레임에 넣는 순간, 다음 수순은 불 보듯 뻔하다.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정권의 강경 노선이 위기를 키운 것 아니냐”는 말로 아군에게 책임을 묻는다. 안보 판단을 정치 책임으로, 정치 책임을 형사 책임으로 바꾸는 길이다. 이건 국가 안보를 다루는 언어가 아니라 정적을 겨누는 법률 언어다. 즉, 비상계엄을 내란죄도 모자라 외환죄까지 뒤집에 씌우려는 개수작의 연장선이다.

그럼 이 구조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다. 오직 북한과 잘해보자는 정치 권력안의 종북 세력들만 국내 모든 기관을 법적으로 장악해 득을 볼 뿐이다. 우리는 손을 묶고, 입을 닫고, 움직이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로 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있는데 방어 의지는 사라진 상태다. 평화는 상대가 약속을 지킬 때 성립한다. 핵을 들고 협박하는 상대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굴종이자 항복의 다른 표현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외교도, 법치도 아니다. 안보를 도덕으로 재단하고, 현실을 구호로 덮는 위험한 자기기만이다. 이걸 그냥 두고 보면, 다음엔 이런 말이 나올꺼다.
“!!ᆢ왜 굳이 대응을 해ᆢ!!”
“!!ᆢ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ᆢ!!”
그때가 되면 이미 늦다. 적은 늘 밖에 있는데, 우리는 내부의 간첩이란 숙주들이 싹을 티워, 열매를 맺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던 국민을 향해 총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