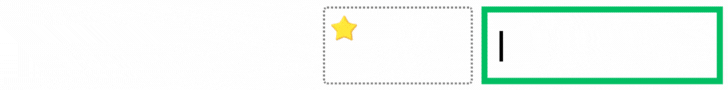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1) 차세대 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화석연료 태우는 연소과정 없이
외부 열 끌어와 쓰는 친환경 기술
공급망 갖춘 中, 제조사만 70개
韓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설치 보조금·전용 요금제 검토
활성화땐 제조·설비 생태계 확대
0.1초,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자 온수가 나온 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였다. 최근 찾은 전북 김제 LG전자 모듈러 주택 ‘스마트코티지’. 방문 당일 바깥 기온은 영하였지만 스마트코티지 실내에는 20도의 온기가 감돌았다. 보일러 덕분이 아니었다. 건물 한쪽에 설치된 90㎏짜리 히트펌프 실외기와 200L 용량의 축열조가 만든 온기였다. 히트펌프가 데운 물이 바닥 배관을 따라 흐르며 온돌 효과를 내고 있었다.
◇중국산 공세 시작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외부 공기의 열을 끌어온 뒤 압축해 고온의 열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데운 물을 난방과 급탕에 활용하며, 연소 과정이 없어 직접 탄소 배출이 없다. 이 때문에 히트펌프는 한국형 녹색전환(K-GX)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술로 꼽힌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약 48%)가 냉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로 소비되는데, 이 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히트펌프는 이 대규모 열 수요를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다. 덴마크공대는 히트펌프를 전기자동차와 함께 전기화의 양대 축으로 평가했다.
현실의 벽은 높다. 첫째는 가격이다. 실외기와 축열조 등 초기 비용이 약 1200만원으로, 100만원 수준의 가스보일러보다 열 배 이상 비싸다. 누진제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역시 부담이다. 난방까지 전기로 해결하면 겨울철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간 가열이 어려운 히트펌프 특성상 대형 축열조 설치가 필수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내 주거 형태의 약 80%가 공동주택인 상황에서 축열조를 지하 기계실 등 공용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추가 하중과 함께 ‘잡아먹는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중국은 히트펌프 보급 단계를 넘어 제조·공급망까지 갖춘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8년 ‘석탄을 전기로 바꾼다’는 매개전(煤改電) 정책을 통해 히트펌프 설치비의 자부담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춘 결과다. 현재 중국 내 히트펌프 제조사만 7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 기반으로 기술력 높여야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유럽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을 각각 5%씩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2년 새 중국산 저가 공세에 직면했다. 권민호 LG전자 상무는 “거대한 내수 시장에 힘입어 재고와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북미 등 선진국 시장을 뚫을 만큼 기술을 확보했지만 내수 기반이 없어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토로다.
2022년 기준 국내 히트펌프 보급 대수는 36만여 대에 그쳤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외에 대성히트에너시스 센추리 오텍캐리어 경동나비엔 등 20여 개 업체가 제조·수입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수 시장이 없다 보니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한국에 둘 유인도 약하다. LG전자는 중국 톈진에, 삼성전자는 쑤저우에 히트펌프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자부담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 정교한 ‘시장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난방효율(COP), 친환경 냉매 기준 등을 차등화해 외국산 히트펌프에 보조금이 무차별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