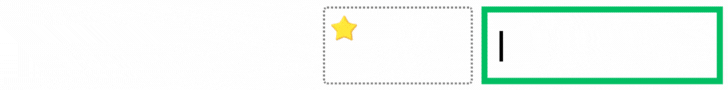도시재생은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니, 듣기만 하면 당연히 좋은 일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쓰는 방식이다. 지금 한국에서 “도시재생”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과연 도시가 다시 살아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냉정하게 물어보면 대답은 쉽지 않다.
지금의 사업을 떠올려보면 익숙한 장면들이 있다. 좁은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화분을 놓고, 낡은 집의 외벽을 고친다. 동네 한가운데 ‘도시재생 거점’이라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선다. 회의실과 프로그램이 생기고, 주민 참여가 강조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동네의 구조는 그대로다. 도로는 여전히 좁고, 필지는 여전히 잘게 쪼개져 있으며,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밀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이미 핵심은 어긋난다.
도시 문제의 정체는 ‘집이 낡았다’가 아니다. 도로 폭, 가로망, 필지 구조, 밀도, 접근성 같은 물리적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핵심을 손댈 수 없게 되자, 정책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구조를 못 고치니, 사람을 고치려 들었고, 공간을 못 바꾸니,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 결과가 거점과 센터다.
이것은 도시재생이라기보다, 도시 구조 문제를 사람 문제로 바꿔버린 방식에 가깝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게 만드는 것이다. 도로를 넓히겠다고 하면 반발이 즉각적으로 나오지만, 벽화와 집수리는 그렇지 않다. 성과 사진을 찍기도 좋고, 임기 안에 관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적으로 보면,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왜냐하면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 전체의 구조인데, 해법은 개별 집, 개별 골목, 개별 주민 단위로 쪼개져 있다. 이해관계자는 끝없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은 느려지며, 유지비는 계속 쌓인다. 시스템으로 보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설계다.
여기서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모든 동네를 다 살리겠다는 생각, 모든 골목을 유지하겠다는 집착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고칠 수 없는 곳은 고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대신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 동네를 억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설계된 다른 곳으로 삶을 옮길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전혀 다른 해법이 보인다.
문제 지역을 붙잡고 끝없이 미세 수술을 하는 대신, 지속가능한 블록을 소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도시를 연속된 덩어리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모듈처럼 관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아니라, 그 블록만 열어서 수술하고 봉합하면 된다.
사실 도시 문제의 90%는 이것으로 해결된다.
안전, 접근성, 일상 편의, 관리 가능성. 이 네 가지만 확보되면 대부분의 삶의 질 문제는 사라진다. 지금은 100개의 문제 블록을 억지로 연명시키느라 100배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몇 개의 제대로 된 블록만 있어도 도시의 숨통은 트인다.
그런데 왜 이 방식이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대신 여기로 옮기세요.”
이 말을 할 정치적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선택된 길이 지금의 도시재생이다. 여기서 계속 살게 만들고, 조금 고쳐주고, 불편은 감수하게 한다. 당장은 반발이 적지만, 문제는 계속 누적된다.
이제 핵심은 “어떤 블록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실제로 옮기느냐”이다. 여기에는 감상이나 이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사람은 ‘더 좋은 집’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더 쉬운 삶’으로 움직인다.

이주를 부르는 블록에는 최소한 다음 조건들이 필요하다.
1. 기존 삶의 반경을 깨지 않아야 한다.
집보다 중요한 것은 동선이다. 병원, 학교, 단골 가게, 익숙한 버스 노선. 이 생활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이 커도 움직이지 않는다.
2. 집이 새로워졌다는 느낌보다 생활이 쉬워졌다는 체감이 먼저 와야 한다.
엘리베이터, 쓰레기 동선, 택배 접근, 관리. 이게 핵심이다.
3. 월 지출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사람들은 싸냐 비싸냐보다 다음 달도 감당 가능한지를 본다. 변동성이 크면 이주는 멈춘다.
4. 보행 폭과 시야에서 즉각적인 차이를 느껴야 한다.
하늘이 보이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밤에 무섭지 않아야 한다. 이 느낌은 처음 10초 안에 와야 한다.
5. 고령자 기준의 무장애 동선이 기본이어야 한다.
실제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든 세대다.
6. 소유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 공공임대, 우선 분양권,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 선택권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하다.
7. 이전과 정착 과정이 개인화되어야 한다.
집단 설명회가 아니라, 1:1 상담과 생활 패턴에 맞춘 안내가 필요하다.
8. 여기서 계속 늙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병원 접근, 돌봄, 응급 동선은 필수다.
9. 원래 살던 동네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
작아도, 임대라도, ‘괜찮은 동네’라는 체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블록을 만들려면, 당연히 제도와 권한 배분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은 전략과 기준을 만든다.
광역은 방향을 잡고, 도시 구조를 조정한다.
기초는 주민을 직접 만나고, 성과를 만든다.
이 구조가 아니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도 끝까지 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권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대신 고령친화 주거 전환, 생활 안전 취약지 관리, 응급 접근성 개선 같은 언어로 제도에 박아야 한다. 하나의 거대한 법이 아니라, 여러 법에 조각처럼 흩어 넣어야 한다. 예산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안 하면 위법이 되는 의무 항목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는 정책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없애기 귀찮고, 없애면 손해이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래서 제도화의 핵심은 신념이 아니라 귀찮음이다.
결국 진짜 도시재생이란 이런 것이다.
못 고치는 곳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구조로 사람을 옮기고, 그리고 도시를 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벽화를 그리며 숨을 쉬게 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