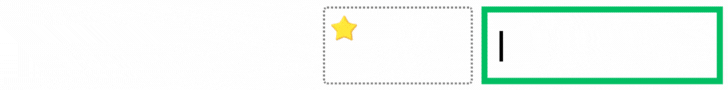어릴적 결혼식장엘 가면 정신이 없었다. 무슨 돗데기 시장 같은 느낌처럼 난잡하고 산만하며 부산스러운 분위기가 머리를 어지럽혔다. 엄마 손을 잡고 다니던 시절엔 엄마 손 놓칠쎄라 불안에 떨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어른들이 인사하라면 하고 머리 쓰다듬으면 그러나보다 하고 그들을 올려다봤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자 어른들은 이렇게 컷냐며 다들 놀라시곤 했다.

그때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끝나면 그 건물을 나와 별도로 마련된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엔 식장안에 식당이 같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단체 사진을 다 찍으면 식권을 받고 밖으로 나가 하객들이 밥을 먹을수 있는곳에 가서 식사들을 했다. 그때 나왔던 메뉴가 잔치 국수다. 당시가 1980년대 였는데, 90년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갈비탕으로 바뀌더니 90년대 후반부터 예식을 보며 함박스테이크를 먹는 경우도 생겼다. 그 이후 뷔페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지금까지 비슷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에 잔치국수를 먹었을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깊다. 우선 국수는 면이 길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길게 이어지는 것을 길함으로 여겼다. 수명도 길고, 인연도 길고, 복도 오래 이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생일이나 회갑에도 국수를 먹었고, 결혼식에도 자연스럽게 국수가 올라왔다. “잘 살아라, 오래 살아라”라는 말 대신 국수 한 그릇으로 축복을 건넨 셈이다.
현실적인 이유도 컸다.
예전 결혼식은 지금처럼 예약제 행사도, 초대장 관리도 없었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줄줄이 몰려왔다. 몇 명이 올지 가늠조차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싸고,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국수였다. 멸치 육수에 면만 삶아내면 수십 명, 수백 명도 감당이 됐다. 고기나 반찬을 넉넉히 차릴 형편이 안 되던 시절엔 국수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또 하나는 공동체 문화다. 그 시절 결혼식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집안과 마을의 행사였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국수를 삶고, 국물을 내고, 그릇을 나르며 잔치를 함께 만들었다. 결혼식은 신랑 신부만의 날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였다. 잔치국수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냥 국수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잔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결혼식장은 깔끔하고 체계적이다. 뷔페에는 없는 음식이 없고, 음식 맛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기엔 예전 결혼식에 있던 온기와 부산스러움, 사람 냄새는 많이 사라졌다. 국수 그릇을 들고 줄 서 있던 풍경도, 서로 자리 양보하며 먹던 모습도 이제는 추억이 됐다. 잔치국수는 단순한 메뉴가 아니었다. 가난했던 시대의 지혜였고, 서로 축복하던 방식이었고, 공동체가 살아 있던 흔적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속에 한 시대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이다.

삶은 뱀대가리처럼 생긴 최악의 좌빨 기득권 중 하나가 세상을 떳다. 광주폭동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유공자로 선정 돼 혜택을 받아 처먹던 새끼이기도 하다. 그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제 슬슬 운동권 새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단계에 진입 했다는 점에 행복감을 느끼며 집에서 잔치국수를 말아보았다.

!!ᆢ멸치육수 사다가 국물내라ᆢ!!
!!ᆢ잔치국수 요리도 아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