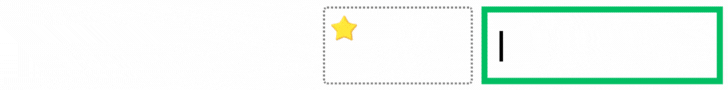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정치검찰'과 '권력의 시녀'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현상의 앞과 뒤다. 정치검찰이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의심받는 검찰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권력의 시녀란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태도와 정신 상태를 조롱하는 표현이다.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대상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수사가 선택되고, 기소의 기준이 법리가 아니라 정권의 유불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검찰은 정의의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더 무서운 건 그다음이다. 명령이 없어도 눈치를 보고, 지시가 없어도 먼저 칼을 빼 들며, 권력의 표정을 읽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검찰은 정치화된 조직을 넘어 권력의 시녀가 된다. 시녀는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존재다. 견제해야 할 대상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할 권력의 방패가 되는 순간, 법은 살아 있는 규범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장식품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말에는 분노가 담기고, 권력의 시녀라는 말에는 경멸이 담긴다. 전자는 정의가 왜곡된 결과를 말하고, 후자는 정의가 포기된 상태를 말한다. 이 둘이 동시에 쓰이는 사회는 더 이상 법 앞의 평등을 믿지 않고, 줄과 편을 먼저 따지는 사회다. 검찰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권도 여론도 아닌 법 그 자체여야 한다. 그 기준이 무너진 순간, 정치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고, 국민은 법이 아니라 권력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된다.

보수우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직화된 좌익 세력에 의해 정권이 흔들렸고, 정치적 배신자들의 집단적 이탈로 권력을 잃었다. 그 이후 권력을 잡은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은 검찰을 도구로 삼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파 인사들을 대거 숙청했고, 그 과정에서 보수 진영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검사 시절 선후배로서 그 작업에 앞장섰던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들 개인의 이력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보수 진영 전체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보수우파는,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 국면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발언 하나에 기대어 윤석열을 보수의 리더 자리에 올려놓는 기이한 선택을 했다. 권력의 성격이 아니라, 순간의 반사광에 눈이 멀어버린 결과였다.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한동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설계했지만, 결국 당원게시판 논란을 기점으로 몰락의 문턱에 서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두 인물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 좌파 권력 앞에서는 시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다가, 우파로 갈아타 권력을 쥐었거나 쥐려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진영을 넘나든 것이 아니라 신념을 팔아치운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 위에 경박함과 허영으로 상징되는 돼멜다 급 영부인까지 얽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이 모든 풍경이 한 편의 저급한 연극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만약 2025년이 이런 혼란을 정리하는 해였다면, 2026년은 적어도 찢의 거짓과 범죄가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는 빌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ᆢ살려달라고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