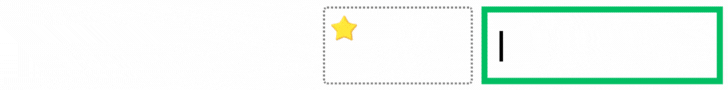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박익희 칼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요?
법 앞의 평등이 흔들릴 때
박익희 기자
경기데일리 2026/01/02

|
법 앞의 평등이 흔들릴 때
눈을 가리고 검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은 선입견과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인류 보편의 법치 원칙을 상징한다.
법의 권위는 바로 이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방향을 둘러싸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유사한 정치적 맥락에 놓인 인사들에 대해 구속
여부와 수사 강도가 현저히 달랐다는 비판은 특검 스스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특검은 정권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진실 규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특검을 두고 “특검을 다시 특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집권 여당은 연일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치 현장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말과 행동의 괴리가 커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깊어진다.
그 결과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환멸 속에, 이른바 식자층을 중심으로 TV 뉴스를 외면하고 주요 신문을 절독하는 현상까지 번지고 있다.
공론장을 떠난 시민이 늘어날수록, 언론의 편파성과 균형 상실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는 한쪽으로 기울 위험에 놓인다.
법과 상식은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기강이다. 이는 거대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조직, 공동체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다.
《한비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치는 바로 이 원칙 위에 서야 한다.
최근 정국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사안들—고위 공직자 및 군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 논란, 헌법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선거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 당선 이후 당 대표 관련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인사 조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제도적 정당성 논란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법·사법·행정 전반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아니면 다수의 힘에 기댄 또 다른 형태의 독주인가. 이 질문 앞에서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여기에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 이른바 ‘사법 파괴 논란’을 낳은 여러 법안 추진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환경 악화 우려까지 겹치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진다. 일자리 없는 노동 보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세상사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운 흐름은 결국 반작용을 부르고,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정치는 힘이 아니라 원칙으로, 법은 편이 아니라 공정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의의 여신상이 다시 눈을 가린 채 저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 그 시험대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요즘 정국을 바라보며 문득 한 대중가요의 탄식이 떠오른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절규 같은 물음이다.
권력은 절제될 때 존중받고, 힘은 스스로를 제어할 때 정당성을 얻는다.
지금처럼 분노와 독주로 내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 끝은 국민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폭주하는 권력보다, 침묵 끝에 일어선 민심의 손을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