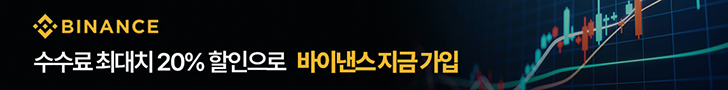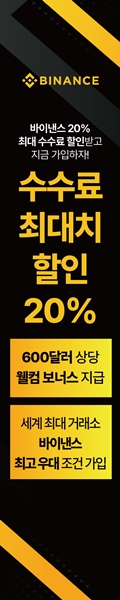원가 절감·기술 개발 집념으로
500만원부터 수억원 슈퍼카 '뚝딱'
비야디 본사엔 외국 바이어 '북새통'
5분 충전 기술 시연하자 "와우" 탄성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중국 선전에서 비야디(BYD) 자율주행 기술인 '신의 눈'을 국내 언론 처음으로 시연했다. /선전=신정은 기자
“바이두와 지리자동차가 협력해 만든 ‘지웨’ 브랜드 전기차입니다. 회사가 사실상 파산했는데, 지리가 AS(사후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죠.”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만난 직장인 시후톈 씨(가명)는 자신의 차에 대해 이처럼 소개했다. 2021년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와 ‘중국 넘버2 자동차 메이커’ 지리가 합작했을 때만 해도 다들 시장 판도가 뒤흔들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실은 달랐다. ‘더 싸고 더 편리한’ 라이벌에 밀려 지웨 판매량은 월 1000대 이하로 추락했고, 추가 투자가 무산되며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중국에는 이처럼 전기차 브랜드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 기술력 키워

광둥성 선전의 최대 자동차 판매 단지인 자진룽 거리. 벤츠, 링컨, 뷰익 등 글로벌 브랜드뿐 아니라 웨이라이, 샤오미, 창안치위안, 광치아이안 등 한국에선 보기 힘든 로컬 브랜드 매장이 빼곡했다.
3000만 대 규모 중국 자동차 시장을 잡기 위해 뛰어든 각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치열한 경쟁이 만든 건 단 하나.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과 기술 개발에 집념하게 됐다. 500만원짜리 전기차나 수억원의 초호화 슈퍼카를 중국이 단시간 내 내놓을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선전 본사는 외국 바이어와 딜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이라이트는 BYD가 내놓은 5분 충전(플래시 충전) 기술. “너무 빨리 충전되니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BYD 직원이 신형 전기차인 한(漢)롱레인지에 충전기를 꽂는 순간 차 안 디스플레이에는 ‘999㎾’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켜지며 초 단위로 충전이 되는 현황이 표시됐다. 충전 속도가 1000㎾가 넘자 외국인들은 “와우” 감탄사와 함께 그 장면을 스마트폰에 담느라 분주했다.
BYD가 글로벌 1위 전기차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BYD에는 전자과학기술연구원, 배터리연구원, 전력과학연구원 등 알려진 연구소만 11개에 달한다. 1만2000여 명의 연구개발(R&D) 인력은 밤낮없이 일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R&D에 쏟아부은 비용만 작년보다 50.8% 늘어난 295억위안(약 5조8300억원)에 달했다. 전통 자동차업계에서 4~5년 걸리던 신차 주기를 중국 기업이 2년 남짓으로 단축하며 판을 흔들 수 있던 배경이다.
◇왕촨푸 “경쟁은 자연법칙”
이렇게 개발된 차량은 ‘딴 세상 차’ 같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뚜껑에서 DJI 드론이 분리되는가 하며, 4개 바퀴가 제각각 돌며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차도 타볼 수 있었다. BYD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을 겨냥해 만든 ‘신의 눈’ 기술도 직접 시연해 봤는데 불법 주차 차량까지 피해 갈 정도로 놀라웠다. BYD 럭셔리 브랜드인 양왕의 ‘U8’ 운전석에 앉아 목적지를 말하니, 알아서 기어를 넣고 핸들을 꺾었다. 내비게이션에 나온 대로 우회전 깜빡이를 켜더니 솜씨 있게 차선을 옮겼다. 좁은 골목에선 속도를 낮추고, 큰길로 빠지자 다시 높였다. 신의 눈은 시범 구간에서만 쓸 수 있는 테스트 기술이 아니라 양산 차량에 적용돼 중국 전역 도로에서 쓰이는 ‘현실의 기술’이다.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BYD는 “신의 눈 오류로 사고가 나면 전부 보상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BYD가 돈이 당장 되지 않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건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경쟁은 자연의 법칙이다.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왕촨푸 BYD 창업주의 말 그대로였다.
넘쳐나는 브랜드…중국의 자동차 시장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
글로벌컨설팅사, 129개 로컬브랜드 중 2030년에 15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

화웨이 중국 선전 매장은 화웨이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다양한 전기차로 가득했다. /선전=신정은 기자
중국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공산당이 만든 ‘과잉 생산’ 체제엔 필연적으로 ‘출혈경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체력이 떨어지거나 기술이 부족한 업체가 사라지고 나면 중국 자동차 군단은 몇몇 생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글로벌 컨설팅사 앨릭스파트너스는 129개 로컬 브랜드 가운데 15곳 정도만 2030년에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선 BYD, 지리차, 상하이차, 베이징차 등 전통 강호와 신흥 전기차 3인방을 이르는 ‘웨이샤오리’(웨이라이·샤오펑·리샹) 그리고 샤오미 등 브랜드 파워와 기술을 두루 갖춘 일부 신생 업체로 경쟁 구도가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을 닫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은 살아남은 다른 전기차 업체로 가거나 유사성이 큰 휴머노이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로 옮겨간다. 중국의 UAM, 휴머노이드 등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사인 샤오펑후이톈(샤오펑에어로HT)이 선보인 플라잉카 '육지항모'. /샤오펑후이톈 제공
최근 방문한 광저우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대표적이다. UAM업계에서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샤오펑후이톈(샤오펑에어로HT)의 ‘육지항모’는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대형 다목적차량(MPV)에 장착했다가 원하는 장소에서 분리할 수 있는 2인용 플라잉카다. 샤오펑후이톈이 이런 차량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15㎞ 떨어진 샤오펑의 공급망과 인재 화수분이다. 그 덕에 육지항모에 들어가는 부품의 99%가 중국산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친환경차산업을 ‘7대 신흥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뒤 대규모 보조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해 수백 개 자국 기업을 무대 위에 올렸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폭스바겐, BMW 등 글로벌 메이커조차 그로기 상태에 내몰렸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로컬 브랜드 점유율은 65.7%에 달한다. 10~20년 전만 해도 중국시장을 장악했던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은 35%로 낮아졌다.
중국은 내수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세계 챔피언’이 되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2009년부터 15년간 중국 정부가 전기차산업에 투입한 자금은 총 2309억달러(약 325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소비자 환급, 세금 면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정부 구매 등이 포함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저리로 대출해주거나 일대일로 등 국가 프로젝트와 연계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강하게 버틴 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 현대자동차·기아 등 한국 기업과 싸우는 플레이가 된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판매량에서 BYD와 지리차가 각각 7, 8위로 10위권에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