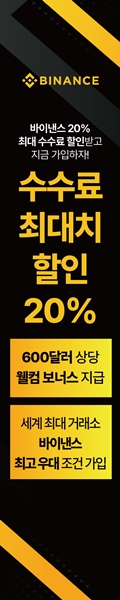몽골계 북방기마민족 '거란'은 내몽골과 요서 지역의 강자로 군림해 왔으며, 서기 840년 위구르 제국이 멸망하자, 흥기하여 당나라 동북지방의 절도사들을 상대로 몇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마침내 907년에 이르러 태조 아율아보기가 요나라를 세우고 몽골과 만주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거란의 국력이 강성해진 것은 936년 연운16주를 점령한부터였다. 문명수준과 생산력이 높은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구도 50만명에서 35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거란 군대의 핵심은 정규군인 오르도부대였다. 이들은 중무장기병으로 기병창과, 활, 검, 철퇴 등을 가지고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철갑 9벌, 활 4개, 길고 짧은 창, 철퇴, 도끼를 가져서 움직이는 무기고라고 불렸다. 병사 1인 당 전투지원병(보급, 잡역) 1명이 배정되어 정군 1인과 부군 2인의 3인 1조 편제를 이루었고, 여분의 활, 창, 극을 가지고 다녔다. 거란군이 무서웠던 이유는 전투지원병(보급, 잡역) 역시 갑옷을 입고 무기를 지녔다는 것이다. 즉 거란은 나라전체가 군사화된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다.
거란군의 편제는 다음과 같았다. 1열에는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이 배치되고, 2열에는 갑옷을 입은 기병이 서며, 3열에는 말까지 갑옷을 입힌 중기병이 배치되었다. 최정예 부대였던 오르도부대는 선봉(3열)에 서고, 전투지원병은 2선 지원대 역할을 하였다. 거란은 전투지원병들도 전투력이 상당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거란 부족병 및 동맹군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유목민 방식으로 산발적인 기마전을 담당했다.
그밖에 징집된 정착농경민들(한족 및 발해유민들)이 보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대개 노역에 종사하였다. 발해인들은 농경민임에도 체격이 크고 힘이 세었기에 거란의 통치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문에 거란은 발해인들을 경계하여 무장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한족들은 비교적 거란에 충성스러웠기에 일부 한족들을 정식으로 편성된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하여 우수한 검병, 석궁병, 노포(투석기)부대로 활약하였다.
중국식 노포(투석기)는 공성작전에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집한 농민무리를 전투부대 앞에 내세워 화살받이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 및 그 밖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할 때 거란의 전술은 후대 몽골군(칭기즈칸) 전술의 선구적 형태였다. 거란족과 몽골족은 비슷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같은 몽골계였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은 공성기술이 없어서 서하를 공격할때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성벽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가는 원시적인 전술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거란족들의 도움으로 공성기술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는 전세계의 성곽과 요새들을 캔뚜껑 따듯이 쉽게 함락시키게 된다.
보통 유목민 기마궁수들이 넓게 산개하여 스웜(포위공격) 전술을 사용하는데 비해, 거란군과 몽골군은 좀 더 밀집된 대형을 이루었다. 오르도 기병들은 500~700기가 1개 연대를 이루고, 10개 연대가 1개 사단을 이루며, 10개 사단이 1개 군을 이루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의 통제된 돌격을 감행하였는데, 각 연대마다 차례로 나아가 돌격한 다음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였다. 기치와 북은 지휘권의 상징이었으며, 이것으로 부대의 진퇴를 통제했다. 한 부대가 적의 전열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 나머지 사단들이 지원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적이 연합공격으로 돌파될 때까지 반복되었고, 때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기록을 보면 거란군대가 매복에도 능했으며, 신속하게 공격하고 후퇴하는 소규모 접전전술에도 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술은 13세기 몽골군(칭기즈칸)이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
거란군은 아주 사납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다. 적을 죽이면 그 피를 마시고 심장과 간을 도려내어 씹어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식인풍습도 13세기 몽골군(칭기즈칸)이 그대로 계승하였다.
글 수
새로운 알림

12월 2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