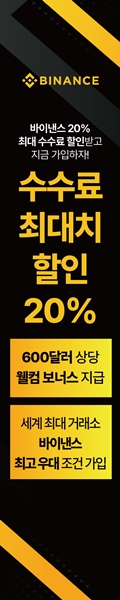이여송도 변방의 무관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요동 철령위의 군벌지위를 세습하여 요동과 여진족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1592년 몽골장수 보바이가 '영하의 역'을 일으키자 이여송은 제독이 되어 명나라 최강부대 요동기병을 이끌고 2,000km나 떨어진 서역(감숙성)의 영하(寧夏)까지 진군하여 3개월 만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여송이 요동을 비운사이 일본군 16만이 조선을 침공하여 임진왜란이 발발한 상태였다. 조선에서 애타게 구원을 요청하자, 요동부총병 조승훈이 5천기의 기병을 이끌고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는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부장 사유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명군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고 압록강을 넘어 요동으로 도주했다.

1593년 2월 이여송이 4만2천명의 명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서 평양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모든 대포를 총동원하여 평양성의 성벽을 무너뜨린뒤 성안에 진입하여 고니시의 일본군 1만2천명을 전사시키고 크게 기세를 올렸다.


이후 이여송은 기동력이 좋은 요동기병을 앞세워서 일본군을 추격하였다. 하지만 벽제관(경기도 고양시)에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참패를 당하게 된다.
당시 일본군이 좁은 고갯길에서 기습을 하자 좁은 공간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는데 명군 피해가 막심했다. '만구다이'라 불리던 몽골출신 궁기병이 무리하게 기병돌격을 감행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일본군이 기병 저지력이 뛰어난 조총병을 장창병의 호위하에 운영하자 용맹한 만구다이(몽골기병)도 패퇴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이여송은 요동기병의 절반 이상을 잃고 명군 장수 4분의 1이 전사하게 된다. 이여송 본인도 포로로 잡힐뻔 했으나 부장 이유승이 몸을 던져 구하여 겨우 탈출했다고 한다.

<벽제관 전투>
이후 요동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이여송은 유정에게 조선 주둔 명군의 지휘권을 인계한 후 요동총병관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 몽골과 전투 중 전사하다.
당시 요동 서북쪽에 토만(차하르부)이라는 무시무시한 몽골부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칭기즈칸의 직계후손(황금씨족)으로서 몽골제국 전국옥새를 가지고 있었다.

<칭기즈칸의 전국옥새>
원래 토만은 베이징 북서쪽 선부(장자커우)에서 유목생활을 했지만, 16세기 중반 투메드부의 알단 칸이 일어나자 본거지를 요동과 가까운 시라무렌강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부터 요동은 토만의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토만의 공격을 이여송 집안이 잘 막았고 그 공으로 요동 철령위의 군벌지위를 세습할 수 있었다.
1597년 겨울 토만의 보얀세첸 칸이 요동을 침공하자, 이듬해 1598년 이여송은 경기병 4천기를 이끌고 내몽골 숲지역을 정찰하다가 몽골기병의 기습을 받고 전사하게 된다.

사후 만력제가 애석해하며 후히 장례를 치르라 명하고, 소보(少保), 영원백(寧遠伯)으로 추증했으며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여송이 조선에 있었을때의 일화이다.
"이와 같은 형세가 있는데도 지킬 줄을 몰랐으니 신총병(신립)은 지모가 없다고 말할 만하다."
이여송이 명나라군을 이끌고 경상도로 남하할때 조령을 지나다 '탄금대 전투'를 듣고 탄식하며 한말이다.

조령(문경새재): 충주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
- 이여송의 거대한 체격
조선 정조시절 백동수와 박지원이 해인사를 거쳐 가야산 부근 원용각에 갔을때 이여송이 쓰던 전립과 전포가 보존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무인이었던 백동수가 호기심이 생겨 보관된 전포와 전립을 살펴보니 엄청 큰 치수였다. 기골이 장대하다던 자신의 체구가 왜소하게 느껴지자, 백동수는 그 절에서 가장 체격이 큰 승려를 불러 전포를 입어보게 했으나, 전포의 길이가 한 자가 넘어 땅에 끌릴 정도로 이여송은 엄청난 거구였다고 한다.
조상이 고려계여서 이여송 본인은 조선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이여송이 우리 나라에 올 때, 그 아버지인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樑)이 추후에 글을 주기를,
"조선은 바로 우리 선조의 고향이니, 너는 힘쓰라."
하였는데, 이여송이 언젠가 그 글을 사적으로 접반사(接伴使)에게 보이기를,
"아버님이 이처럼 분부하셨는데, 감히 귀국을 위해 힘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의 선조는 바로 우리 나라 이산군(理山郡) 출신인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였다. 이여송이 30여 세의 나이로 처음 우리 나라에 왔을 때에는 안빈(顔鬢)이 매우 청수하였는데, 영남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수염에 흰 것이 섞여 있었다. 그가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를 위하다 보니 이처럼 반백(斑白)이 되었다."
<선조 26년 9월 1일 임자 3번째기사 (15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