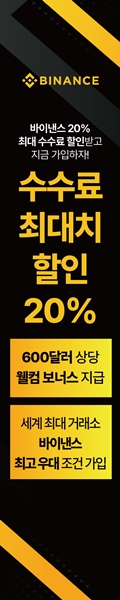문치주의에 빠져있던 조선왕조에도 군대가 있었다.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추고 군사훈련만 받던 전문군인이 8천명 정도 있었다.
- 16세기 말 조선 중기(임진왜란 직전) 전투병력 규모
1. 수도 한양을 지키는 경군(京軍)의 갑사 2,000명
2. 국경을 지키는 국경수비대 6,000명
도합: 8,000명

이 8천명의 전문군인들은 당시 조선 최강의 군사들로서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핵심병력들이었다. 하지만 병력숫자가 너무 적고 전투력이 약해서 외국과 전면전이 발발하면 모두 무너졌다. 국제경쟁력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 주변국들은 조선군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일본군 제8군 총대장, 중군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
"무기의 질이 형편없다. 소수는 열심히 응전하여 싸우지만 지휘관과 장수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대부분 도망친다."
"조선의 장수는 도망치는 속도로 뽑는가? 이나라엔 무사라 부를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 일본군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
"조선 정규군의 수준이 내 예상보다도 낮다. 전쟁이라곤 모르는 불쌍한 농민들과 여인들을 징집한 것 같다."
"조선군은 선봉에 서야 할 장수가 휘하 부관들과 병사들이 죽어가는데 이미 도망치고 없다."
"이 상태라면 조선군 100만이 온다고 한들 우리 군대 1만을 당해내지 못한다."
- 명나라 구원군 사령관, 대제독 이여송
"조선군의 무기와 훈련상태가 형편없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은 없고 대부분이 조약한 농기구와 돌도끼 등으로 무장을 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왜적의 전술은 요란하게 총포를 쏟아내고 그 후 귀신의 얼굴을 한 기병들과 장창으로 무장한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온다. 그런데 총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조선군의 8할은 이미 도주하고 없다."
"조선군은 오로지 도망치는 것에 특화되어있다. 이들에겐 후방 경비 밖에 맡길 수가 없다."
"귀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라 일컬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선비와 서민이 농사와 독서에만 치중한 탓으로 이와 같은 변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천조는 귀국을 금구 무결(金甌無缺)한 국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귀국은 이를 알고 있습니까?"
-선조실록 39권, 선조 26(1593)년 6월 5일 무자 5번째 기사-
귀국의 강한 군대는 본디부터 천하에 소문이 났는데, 수(隋)ㆍ당(唐) 때는 어째서 그리 굉장했으며 풍신수길(豐臣秀吉)의 난에는 어째서 그리 심히 겁을 내었습니까? -<금계일기> 5월 20일자 기록-
"중원(中原) 본토인(本土人) 여응주(呂應周)란 자가 글로 써서 보이기를 ‘가정(嘉靖) 연간에 왜적이 소주·항주를 함락했었으나 그뒤에 방비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소매를 잡고 ‘이런 넓은 소매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갓을 가리키면서 ‘이런 싸맨 머리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시를 지어 보이기를,
<시부는 진나라의 유풍이요, 병서에 대해 온 나라가 모른다. 높다란 관이 무인의 고깔이요, 넓은 소매 옷의 군복일세. 무딘 창은 섶나무와 같이 썩고, 성을 쌓은 높이는 어깨와 가지런하네. 왜구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자, 팔도가 조각 구름처럼 흩어졌네.> 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김명원(金命元)과 같이 앉아 있을 때 신들의 갓과 소매를 가리키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서 왜적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1593)년 2월 20일 乙巳 2번째기사-
지금 만약 싸우려고만 한다면 2∼3년이 못 가서 귀국이 다시 병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보아 하니 귀국은 오로지 시부(詩賦)만을 숭상하고 무비(武備)는 닦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서도 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선조실록 36권, 선조 26(1593)년 3월 10일 을축 1번째기사-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일찍이 강국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어찌 이토록 나약한가. 당신들은 마땅히 돌아가 당신 나라에 돌아가 국왕에게 고하고 자강(自强)에 힘써 나라를 보존하도록 하라. -요동순무(遼東巡撫) 이화룡(李化龍)의 발언-
지금 피차 책봉과 강화를 논의한지 이미 5년이 지났고 전투를 멈추고 전쟁비용을 줄인 것은 3년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일찍이 조선의 군신(君臣)이 통렬히 매진하여 군량을 비축하고 군대를 연마하여 예비책을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략)
지금 조선의 소청을 보면 스스로 군사를 연마하지 않고 중국 군대를 자기 군대로 삼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며, 스스로 군량을 비축하지 않고 중국의 병량을 군량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안일함에 젖어 타인에게 그 노고를 전가하고 자신은 안주한 채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니 소국이 대국에게 얻을 수 있는바가 아니며, 속번(屬藩) 이 천조(天朝)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97년 1월 25일 명나라 병부가 조선 사신에게 전해준 공식 회답문의 내용 일부-
이 때 조선의 승평(昇平, 평화로운 세상)이 오래 되어 군대는 전쟁을 익히지 않았고 李昖(-선조) 또한 술에 빠져 방비를 게을리 했다. 갑자기 섬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키자 바라만보고도 모두 무너지고 이연은 왕성(王城)을 버리고 도망쳤다.
-<明史> 권320 列傳 208, <朝鮮>-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나고도 정신을 못차렸다.
청나라 사신이 귀국하여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청 황제 홍타이지한테 보고하자, 홍타이지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汗)이 여러 왕자들과 더불어 매번 이르기를 ‘조선은 아녀자의 나라인데 무엇을 믿고 저러는가.’ 하고, 항상 웃는다.”
-조선왕조실록 1636년 9월 10일 기사中-
문치주의(文治主義)가 문제였다. 문치주의는 말그대로 지배층들이 병법과 무예를 닦지 않고 문치(文治)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조선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왕과 귀족들은 모두 반무사층(군인)이었고 군사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지배층이 될 수 없었는데 이씨조선부터 성리학에 빠진 지배층들이 군사문제를 외면하자 군사력이 약해졌다. 동시대 서양에서도 귀족들은 모두 반무사층(군인)이어서 전쟁이 터지면 귀족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했다. 즉 조선왕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여러차례 위기에 처하다가 1910년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