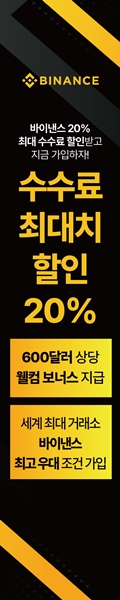땅을 농민들에게 빌려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개념이었다. 신하들에게는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을 주었다. 땅을 빌려주는 개념이기에 왕이 언제든지 땅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전근대시대 동아시아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왕토사상은 심각한 내재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토지겸병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농 비율이 떨어져서 국가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토지겸병이란 '남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땅에 합친다'는 뜻이다.
1. 흉년이 들어서 농민들이 세금을 바치지 못하면 빚을 지게 되어 토지를 버리고 소작농(농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2. 왕권이 약해지면 귀족들이 권력을 앞세워 농민들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았다.
농민들은 원래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에 귀족들한테 땅을 빼앗겨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전근대시대 중국, 한반도, 일본의 왕조들은 개국한 뒤 100년이 지나면 모두 토지겸병 문제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세수가 감소하고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의 횡포로 인해 노비숫자가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란과 내전이 발생하고 국가재정 악화로 인해 군사력이 약해지면 이민족이 침입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동아시아에서도 토지겸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조선왕조였다.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것도 이때문이다. 지배층(양반)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노비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부정부패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지방관리직(관찰사, 수령)과 무관은 중앙에 뇌물을 바쳐야 얻을 수 있었다 (매관매직). 이렇게 관직을 얻은 지방관리들과 무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리 없었다. 지방관리들은 뇌물로 바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백성들을 마구 수탈하였다. 무를 천시했던 조선은 무관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무관은 합법적으로 수탈이 가능한 관직이었다. 뇌물로 바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군사들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고 군수물자를 착복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

고을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의 재물들을 마음대로 수탈했기에 백성들은 어차피 빼앗길 재산을 축적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조선에서는 '정치적 성공'이 경제적 성공을 의미했고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되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집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했고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없었다.

반면에 동시대 서양에서는 평등사상(수평문화)으로 인해 사유재산 개념이 확실했다. 이때문에 세금도 함부로 걷을 수 없었다. 세금을 걷는 명분이 확실해야 했다.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참정권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당시 영국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낮은 세금만 부과했음에도 정치적 권리를 주지 않자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다.


사유재산을 보장한 서양에서 백성들의 납세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 치안, 행정, 인프라 확충, 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라고 여겼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의 세금은 백성들의 의무였다. 국가의 모든 재산은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왕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다른 권리는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해서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