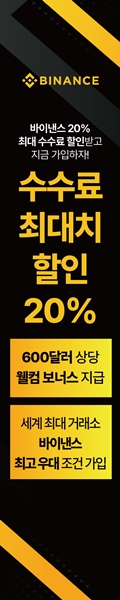중국인들의 특이한 세계관이 영향을 미쳤다. 전근대시대 중국인들은 오직 중국만이 진정한 문명국이었으며, 주변민족들은 오랑캐라고 업신여겼다.

천하에는 오직 하나의 통치자인 중국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천하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거나 황제가 임명하는 제후가 다스리는 질서를 만들었다.
제후는 황제를 위해서 '조공'이라는 공물을 정기적으로 바치는게 도리였고, 황제는 제후에게 하사품을 내려주었다. 이것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던 국제무역의 개념이었다.
중국인들은 자국에 거의 없는 이국적인 물품들만 조공품으로 받았다. 경제적 가치(사용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특이한 물품들을 받아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예를들어 중국황제들은 동물원을 만들고 외국에서 조공으로 바친 신기한 동물들을 키움으로써 자신이 천하의 유일한 군주라는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했다.

중국황제의 하사품(유교경전, 비단, 도자기, 악기)을 받은 제후국의 왕들은 신하들에게 하사품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중국 황제와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했다. 조공무역은 그 횟수도 중국황제가 엄격하게 통제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제무역으로는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웠기에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반도의 조선왕조는 이러한 중국중심의 조공무역 질서를 가장 충실히 따른 나라였다. 조선에서 국제무역(조공무역)은 오로지 양반관료들만 가능했다. 이때문에 조선에서는 '정치적 성공'이 경제적 성공을 의미했고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되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집중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했고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없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한반도(조선)는 국제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부와 일자리의 창출이 어려워져서 폐쇄적인 농업국가(가난한 약소국)로 전락하게 된다.
국제무역이란 민간상인들의 경제적인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시아의 국제무역은 정치에 구속된 특이한 거래가 되어버려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자본이 축적되고(거대자본의 등장) 축적된 자본을 과학기술에 투자하여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동아시아는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12세기부터 역내 자유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다.



메디치 가문도 유럽의 활발한 국제무역(북방무역, 지중해 무역) 덕분에 환전업(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우게 된다.

이후 서양에서는 대항해시대를 통해 자본주의(은행, 주식회사, 증권, 보험회사)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축적된 자본을 과학기술에 투자하자 생산성이 향상되어 산업혁명을 이루고 근대화 시대를 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