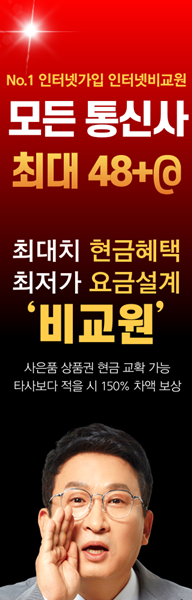고구려는 서기 5세기 초 광개토대왕때 요동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요동의 산지와 구릉성 지형을 이용하여 산성(山城)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한다. 이들 산성은 고구려 백성 및 군사들의 집단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고구려 교통망과 국방의 주요거점이었다. 이러한 산성 간의 교통로를 건설하면서, 산성을 거점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산성간의 교통망 연결을 통하여, 요하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구축하였다.



<16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벽이 남아있는 고구려 백암성 모습: 랴오닝성 랴오양시>
또한 고구려인들은 주변의 북방민족(몽골족, 여진족)과 달리 농업기술이 뛰어났다. 동북평원의 비옥하고 광대한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은 뒤 주요성마다 수십만석의 양식을 저장해 놓았다. 안시성을 예로들면 성안에 10만명이 거주할 정도로 넓고 양식이 풍부했다. 외부지원 없이도 수년 동안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던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은 강력한 중국의 통일제국들도 뚫지 못할 정도로 막강했다. 고구려가 멸망직전까지 최남단 황해도에서 최북단 부여성(지린성 창춘시 눙안현)까지 1,000km의 강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산성네트워크 덕분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과 물자들을 모두 성안으로 대피시켜 영토와 국력을 보존했던 것이다. 덕분에 지방 어느 곳에서도 반란하나 일어나지 않고 고구려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있었다.

이렇게 강력했던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집안싸움 때문이었다.
서기 666년 고구려의 실권자였던 태막리지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그의 세아들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연개소문의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태막리지를 이어 받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후 연남생은 지방의 여러 성들을 순시하기 위해 평양성을 떠났고 두 아우인 연남건과 연남산 등을 수도에 남겨두어 뒷일을 맡아 보도록 하였다. 수도인 평양성을 맡길 정도로 연남생은 동생들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남건, 연남산 두 동생은 권력을 탐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평양성을 장악한 뒤 연남생의 아들이자 조카인 연헌충마저 살해하고 말았다. 정변 직후에 스스로 태막리지가 된 연남건은 군사를 보내어 지방에 있던 연남생의 세력을 토벌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연남생은 수도 평양성에서 멀리 떨어진 옛 수도였던 국내성에 피신해서 이를 방어하는 한편 아들 연헌성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연헌성 묘지명에 의하면 적국인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책은 연남생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들 연헌성이 "살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제안해 관철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당 고종은 항복한 연남생에게 특진 요동 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를 제수하고 현도군공으로 봉했다.
당시 당나라는 거듭된 고구려 원정실패로 사실상 포기하려던 찰나, 연남생의 항복으로 고구려 원정을 재개하게 된다.
그해 4월, 당나라에서 혜성(彗星)이 필성(畢星)과 묘성(昴星) 사이에 나타났다. 이를 본 허경종(許敬宗)이라는 신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혜성이 동북방에 보이는 것은 고구려가 망할 징조다.”
당나라군의 사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666년 12월, 당 고종은 이세적을 요동도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봉하고 고구려 원정을 명했다. 또한 방동선(龐同善)과 계필하력을 요동도행군 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전량사(轉糧使)·두의적(竇義積)·독고경운(獨孤卿雲)·곽대봉(郭待封) 등도 이세적의 지휘를 받게 했다. 수군도 편성하여 수륙양면에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적리도행군 총관 곽대봉(郭待封)에게 수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고 별장 풍사본(馮師本)을 보내 군량과 병장기를 공급하게 했다.
당나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대규모의 원정군을 투입하였지만 전쟁 초반 고구려가 잘막았다. 당나라군이 고구려 서쪽의 요충지 신성(랴오닝성 푸순시)을 공격하였지만 6개월 동안 함락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구'라는 간첩에 의해 어이 없이 무너졌고 주변의 16개성이 동시에 함락당했다.

고구려군이 신성을 탈환하려 했지만 당나라 장군 설인귀가 배후에서 공격해 오는 바람에 패전하였다. 신성에서 후퇴한 고구려군이 금산(金山)에 진을 치자 당나라 장군 고간이 쳐들어왔다. 고구려군은 고간의 군사를 섬멸하고 여세를 몰아 신성으로 진격했지만 설인귀의 기습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이후 설인귀는 남소ㆍ목저ㆍ창암 세 성을 차례로 함락하고 연남생의 군대와 합류했다.

<당나라 명장 설인귀>
이세적은 적리도행군 총관 곽대봉(郭待封)에게 수군을 이끌고 평양으로 나아가게 하고 별장 풍사본(馮師本)을 보내 군량과 병장기를 공급하게 했다. 이에 고구려는 해군을 동원해 풍사본의 선단을 패수구 앞바다(대동강 하구)에서 모두 전멸시켰다. 이 때문에 곽대봉의 군사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됐다.
서기 668년 정월, 이세적의 고구려 공략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당 고종은 우상(右相) 유인궤(劉仁軌)를 요동도행군 부총관으로 임명하고 학처준과 김인문을 부장으로 삼아 요동으로 지원군을 보냈다. 이에 힘을 얻은 이세적은 2월에 고구려 북쪽 요충지인 부여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부여성이 함락되자 인근에 자리한 40여 개의 성도 차례로 무너졌다. 곡창지대였던 동북평원이 당나라군에게 점령당한 것이다.
고구려가 5만 명의 군사를 급파하여 부여성 탈환에 나섰다. 하지만 설하수(薛賀水) 전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군사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세적은 승세를 타고 진군해 압록강 일대에 있는 대행성(大行城)과 욕이성(辱夷城)을 차례로 함락했다.

연남생의 항복으로 지리 및 군사배치 등 고구려의 허실(虛實)을 손금 보듯이 보게 되자 고구려가 드디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서기 668년 9월 26일 마침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무너졌다. 고구려는 동명성왕 이후 705년 만에 제28대 보장왕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668년 10월, 이세적이 보장왕을 비롯해 무려 20만 명의 고구려인(대부분 지배층)을 끌고 당의 수도 장안에 입성했다.
멸망 당시 고구려는 5부·176성·69만여 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강토가 사방 1000km에 인구 350만명, 30만명의 정예군을 보유했던 강대국으로 수, 당 등 중국의 통일제국과 전면전을 벌일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다.
당시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이 두차례 모두 실패하자 원정을 포기하려고 하였고, 신라는 백제땅에만 관심이 있었다. 애초에 신라같은 남쪽사람들은 추운 북쪽땅에 관심이 없어서 한강이남의 삼한땅만 차지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집안싸움으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세아들들이 모두 잘못하기는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 형을 배신한 두 동생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수 있다. 형인 연남생이 똑똑하여 능력이 있었고 동생들을 잘 대우해 주었는데도 수도를 비운 틈을 타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형만한 아우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순리를 거스르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형이 포악하고 무능했다면 정변을 일으킬 명분이 있었지만 정말 아무 이유없이 정변을 일으켜 고구려를 망하게 한 것이다.
SBS 사극 '연개소문'에서는 아버지 연개소문이 장자의 자리를 탐내다가 나라를 망친 두 동생 연남건과 연남산의 목을 벤 뒤 당나라군에게 잡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영되었다. 고구려 멸망을 막으려면 연개소문이 진작에 두 동생을 유배보내거나 죽였어야 했다. 반골(反骨)의 상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평양성'의 오프닝에서는 연남건이 장남 연남생을 제치고 나서면서 "저 신라 잔내비들부터 쓸어 버리디요!"라고 하자, 연남생이 "너는 빠지라우!" 라고 하면서 형제간의 불화를 묘사하였다. 하지만 오만방자하여 고구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연남건을 고구려 영웅으로 묘사하고 똑같이 오만방자했던 연남산을 두형들의 중재자로 묘사하여 고증이 아주 엉망이었다. 연남생을 대당 협상파, 연남건을 대당 강경파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것이다. 당시 고구려 연개소문 일가에는 대당 협상파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개소문이 협상파를 모두 제거한뒤 독재정권을 세웠고 자체적인 군사력으로 당나라를 2차례 막아내는데 성공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