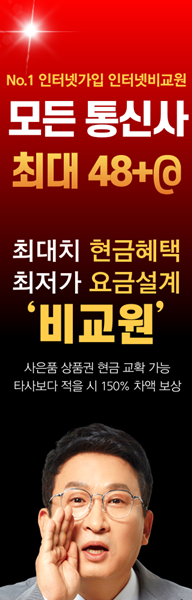15세기 ~ 16세기 동아시아는 명나라 시대였다. 이 시대에 명나라와 맞설 만한 강대국이 존재하지 않아서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중국 독점체제의 동아시아는 국가간 경쟁이 없었기에 문명수준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여 서양보다 뒤쳐지기 시작했다.
동시대 서양은 국가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크게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항해시대를 통해 아라비아의 범선과 중국의 나침반을 개량하였고 국가간 전쟁이 빈번해지자 대포, 군사기술, 외교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중국이 세계최초로 화약과 대포를 만들었지만, 15세기 중엽이 되자, 서양의 대포가 중국제 대포보다 훨씬 우수해졌다. 이로인해 15세기 말엽이 되면 중국제 대포는 모두 사라지고 유럽제 불랑기포만 사용되었다. 적은 화약으로도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와 파괴력도 더 강했기 때문이다. 1630년 명나라의 예부상서 서광계(徐光啓)는 화약과 포탄의 제조를 전적으로 유럽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의 조선 왕조는 철저히 중국(명나라)에 고개를 숙이면서 평화를 누렸지만, 사회가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된 삶만 반복하였다. 또한 내부모순(기득권, 신분제도, 부정부패, 문치주의)으로 인해 민생은 어려워졌고 국력과 군사력은 약해져만 갔다. 원래 이런나라는 망했어야 했지만 명나라의 보호와 유교사상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다.
이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쟁이 있던 사회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전국시대 동안 지역끼리 다른 나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실력이 없으면 망하는 전국시대 동안 철저히 실력위주의 사회여서 일본 전국이 부국강병을 통해 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통일을 하여 발전된 힘이 합쳐지자 일본은 순식간에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 하였고 명나라의 패권에 도전하였다. 1592년 일본은 명나라의 제후국이었던 조선을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초전에 신속하게 진격하여 한양과 평양을 점령한 후 부대를 재편성하기 위해 진격을 중단하였다. 이에 명나라 조정에서는 1593년 1월, 이여송이 이끄는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였다. 이후 명나라 군대는 평양 외곽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크게 기세를 올렸다.

이후 이여송은 기동력이 좋은 요동기병을 활용하여 도망치는 일본군을 추격하였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추격한 나머지 일본군이 반격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벽제관(경기도 고양시)의 좁은 고갯길에서 일본군은 명나라군을 기습하였고 좁은 지역에서 백병전이 벌어지자 명군 피해가 막심했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 요동기병의 절반 이상을 잃고 명군 장수 4분의 1이 전사하게 된다. 이여송 본인도 포로로 잡힐뻔 했으나 부장 이유승이 몸을 던져 구하여 겨우 탈출했다고 한다.

이후 전쟁은 교착상태를 유지하면서 명나라 일본 양국이 강화협상을 하였다.

<심유경과 고니시의 강화회담>
강화교섭의 결과는 중국 외교정책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중국인들은 중화사상 때문에 이민족 지배자가 자신들을 중국인들과 동격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땅의 분할을 원했고 명황실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명나라사절단이 제시한 조건은 히데요시가 명나라 신하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대륙을 침범하지 않는 데 동의하면, 그를 일본의 왕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이었다.
명나라의 강화조건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히데요시는 이듬해 14만의 병력을 다시 한양으로 진격시켰으나 명나라 군 10만 명이 일본군의 진격을 가로막았다.

<1597년 10월 직산전투>
조선의 수군제독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과 함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과 증원병력을 차단하였다. 겨울이 오자 일본군은 남해안으로 다시 퇴각하였다.

1598년 조명연합군이 울산, 순천, 사천을 공격하였으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실패하였다.

<1598년 울산성 전투>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된다.
명나라는 일본의 패권도전을 저지하면서 전략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막대한 전비가 소모되었고 재정적자로 인해 요동방어군이 약화되자 45년 뒤 여진족(누르하치)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주변민족들(일본, 몽골, 여진)이 모두 명의 패권에 도전할때 조선만 명을 섬기는데 집중했다는 것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역사이다. 지배층들이 국력과 실력을 키우기 보다 기득권을 지키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중화사상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외교정책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