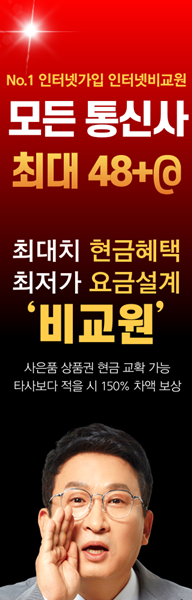함경도는 면적이 52,323㎢ 로서 가장 넓은 도이다. 남한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최남단 금야군(영흥군)에서 최북단 온성군까지 거리는 658km에 달한다. 서울-부산 간 거리(428km)보다 230km나 더 멀다. 하지만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평야는 해안지역에 좁게 분포하고 있으며 기후가 한랭하여 농업생산력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진족(말갈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인구도 적었다.
1592년 7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제2군은 강원도 북부를 거쳐 함경도로 진입하게 된다. 일본군이 함경도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함경도 병마절도사 한극함이 육진의 기병 1,000기를 이끌고 마천령 이북 해정창(함북 김책시)까지 남하하였다.

한극함의 기병을 본 일본군들이 창고로 후퇴하여 쌀가마니를 방패삼아 조총으로 응사하자 조선군은 300여명의 군사를 잃고 줄행랑을 쳤다.

이후 일본군은 함경도 전역을 점령하였다. 일부 일본군은 개마고원 깊숙히 진출하기도 하였다.
- 일본군과 여진족의 전투
일본군이 함경도로 들어온 이유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가토는 두만강 너머 만주 지역을 탐사하려고 하였다. 2,000여명의 군대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진격한 가토는 여진족 노토 부락(老土部落)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군과 여진족이 맞붙은 전투였다.

전투 초반 일본군이 손쉽게 여진족을 제압하고 성을 점령하였다. 하지만 이후 여진족 기병이 인해전술로 포위공격을 해오자 소규모 병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로 철수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와 여진땅(만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였다.
1. 오란카이(여진족)가 사는 땅은 조선 보다 2배나 넓은 광대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달단(몽골)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기에 함경도를 통해 명나라로 진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 함경도와 만주는 밭농사 지역으로 잡곡만 생산되어 일본군이 먹는 군량미(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북관대첩
함경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군을 환영하고 이들의 정책에 협조하였지만, 1592년 가을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함경도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은 9,000여명(전체병력의 40%)의 군사를 잃고 한양으로 철수하게 된다. 함경도 의병들이 잘싸운 것도 있지만 일본군들이 함경도의 매서운 겨울 추위에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가토 기요마사와 그의 병사들은 일본에서도 가장 기후가 따뜻한 서남부 지역 출신이고 월동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두가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1. 일본군들이 함경도의 기후와 농업생산력에 대해 정말 무지했다. 결과적으로 점령지에서 동사자가 발생하고 반란(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일본군의 무식함은 임진왜란 실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일본의 일부 가신들은 조선의 영토가 남북으로 길고 북쪽 끝은 달단(북방기마민족)과 접해서 일본과 판이하게 다르기에 일본열도 내에서의 전투에만 익숙했던 일본군들이 도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풍신수길과 장수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월동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조선원정을 나갔다.
2. 전근대시대 함경도는 농업생산력이 떨어져서 대규모 군대가 주둔할 수 없는 똥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