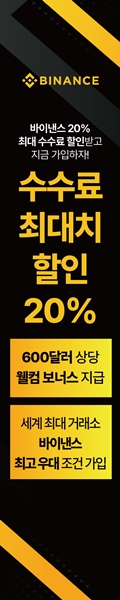관세음보살의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은
아왈로끼따쓰와라, 아왈로끼떼슈와라로 나뉘는데
초기에는 아왈로끼따쓰와라 였다가 5세기 이후 아왈로끼떼슈와라로 표기가 바뀜
이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는데
관세음보살로 번역되는게 아왈로끼따쓰와라(관찰된 소리)
관자재보살로 번역되는게 아왈로끼떼슈와라(관찰된 스스로 존재하는 자)
관음경을 보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리를 보고 구제하러 와주시기 때문에
세상(世)의 소리(音)를 본다(觀)는 뜻의 관세음보살이 맞는 번역이고, 원래 산스크리트어 이름도 아왈로끼따쓰와라가 맞는거임
하지만 관자재보살의 원어가 된 아왈로끼떼슈와라는
단순 오타같은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격을 더 높히기 위해 5세기 인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변경한거라고 함
그리고 이건 그냥 취향 문제일수 있는데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 원어를 음역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은 한문으로 번역된 이름을 사용하는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됨
한자어로 통일 시키거나 산스크리트어로 통일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
나무무량수불, 나무관세음보살
or
나모 미따바야 붓다야, 나모 (아랴) 아왈로끼따쓰와라야
(아랴 는 성스러운 이란 뜻임.. 없어도 되지만 관세음보살 염불할 땐 성스럽단 표현을 붙여주는게 일반적..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모습으로 변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 33가지 중 제일 기본형이 성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도 물론 음역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천수경에 나오는 "나막 알약바로기제새바라야"가 "나모 아랴 아왈로끼따쓰와라야"를 음역한 것
하지만 이건 중국어로 음역된 한자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발음한것 뿐임
지금은 정확한 산스크리트어를 얼마든지 알 수 있고, 한글로 더욱 더 가깝게 표기할 수 있으니
나모 아랴 아왈로끼따쓰와라야 를 추천
그럼 산스크리트어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봅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 나모 아랴 아왈로끼따쓰와라야
관세음보살 → 아왈로끼따쓰와라
옴 아로늑계 사바하 → 옴 아로리크 쓰와하
나모 아랴 아왈로끼따쓰와라야
아왈로끼따쓰와라
아왈로끼따쓰와라
아왈로끼따쓰와라
... (원하는 횟수만큼)
옴 아로리크 쓰와하
새로운 알림

11월 26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