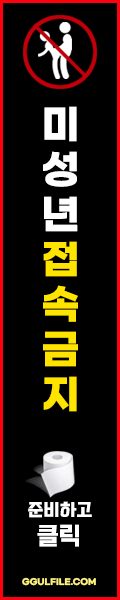지난 [쿨레쇼프 효과]에 이어 편집에 관한 똥글 두 번째.
이번엔 너무 흔해서 이게 뭐 대수냐? 싶을 정도가 지나친 [고전적 편집]에 관한 글이당 헤헤
(사실 좆도 모르기 때문에 글의 신빙성은 거진 야매적이고, 팩트니 뭐니 제대로 제시할 끈기도 엄따. 다만 얼추 그렇다더라~ 정도의 아귀맞음? 정도는 설치류 잦이마냥 자부함. )
[고전적 편집]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짧게 영화라는 매체의 뿌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겄다.
우리가 대개 초창기 고전 영화들(그러니까 채플린 이전의 더더더 영감 스러운)을 찾아보게 되면, 화면비도 화면비지만 구도랄까 앵글이
무청 정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 당시 영화는 연극의 연장선에 불과했기 때문이제. 거진 프로시니엄 아치? 프로니시엄 아치? 시발 하여간
객석에서 연극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한 시선으로밖에 영화를 촬영할 수 밖에 엄썼거덩.
기술력을 떠나서 창작자, 수용자 할 것 없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방법이 딱 거기까지 밖에 준비가 안 되었었던거제.
여기서 영상하나 보고 가자.
앞서 말한 프로시니엄 아치인지 프로니시엄 아치인지 하여간 연극무대를 고스란히 녹화한 것만 같은
조르주 멜리어스 영감님의 [달세계 여행]
초장부터 그냥 관객이 연극무대를 보는 마냥 정면, 정면, 정면의 연속이다. 거기다 한 씬이 하나의 쇼트로 구성되있다 시피한, 어찌보면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단편적 구성이제. 그래도 영화를 마법적 순간들로 가득하게 채운, 영화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ㅋ작ㅋ 인 것 같다.(오죽하면 스콜세지 영감님이 휴고라는 영화로 멜리어스와 영화에 대한 찬가적 영화를 만들었겄어)
다시 돌아가서.
당시 대개의 영화들이 저런 유형의 편집꼴을 유지하던 상황에서
천조국에서 한 인간이 등장하였으니.
오늘날의 영화 아빠라 불리는 D.W 그리피스 영감님이다.

는 훼이꾸고

이 턱돌이임 ㅇㅇ
영화사에서 이 양반 이름 빼면, 특히 헐리우드 스타일! 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내신 양반이시제. 롹으로 치면 지미 핸드릭스와 같달까 할 정도로 영화의 많은 것들을 정립한 양ㅋ반ㅋ
이 똥글의 주제인 [고전적 편집]의 알파와 오메가, A to Z 가 바로 이 양반의 영화들에서 첫발을 내 딛는 거거덩.
자 이제 들어간다.
과연 [고전적 편집]은 무엇인가!?
시발 너무 당연해서 설명하기가 구차할 정도로 익숙한 오늘날의 영화 대부분이 사용하는 절대규칙 같은거다. 산소같은 거라서 어 씨발? 하며 생각할지도 모름
잠시 그리피스의 단편영화 한 편 보고가자. 꼭 다 안봐도 됨 ㅋ
음.. 진짜 뭐 별거 없구만 싶은 영화다. 여기서 뭘 어쩌라는거야? 싶기도 하고. 거기다 내용 시발 ㅋㅋㅋㅋ
하지만
앞서 [달세계 여행]을 복기해보자. 객석의 관객을 눈을 빌어 무대와 배우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뿐인 밋밋한 영화라 할 수 있겠다.













겨우 14장 남짓한 이 사진들이 이 영화의 편집점이자 씬 갯수다. 편집이라고 부를 것도 없다.
하지만 그리피스의 영화로 넘어오게 되면 교차편집, 평행편집, 더블액션 등이 가미된 풍부한 편집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내 말이 잘 동의가 안 될 게이들이 많을것 같다. 도대체 뭐가 이 씨발놈아? 하면서 민주화 줄 것 같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간다.
소녀와 그녀의 신념(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냐)의 초반부를 보자. 한 쪽 방엔 여자가 앉아있고, 다른 방엔 남자 둘이 오다닌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멜리어스'식으로 영화화 했다면 어땠을까? 걍 무대 세트에다가 째로 지어놓곤 카메라로 주우우우욱 찍어댔을 거다.


하지만 그리피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자가 앉아있는 방에서 남자가 나갈 때 커팅! 이어 그 방에서 나오는 남자를 이어붙인다.
이게 뭐 씨발, 이라고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과거엔 이러한 시도 자체가 파격이었다. 관객도 관객이지만 감독들에게조차도 말이지. 아니, 연속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는데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 하지만 그리피스는 이를 '운동의 일치', '시선의 일치'를 통해 성공시킨다. 거기다가 편집이 되었는지 조차 관객들이 알 수 없게끔 부드럽게 말이지.
이걸 사람들은 불가시적 편집이라고 한다. 눈에 안 보이는 편집이라는거지.
단절된 공간을 운동의 방향성을 이용해 편집을 통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었고, 또한 이 편집점이 운동의 방향성을 통일시켜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든거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 장면. 대뜸 기차 도착하는 장면이 삽입되더니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창 밖을 본다.
오늘날이야 유성영화니까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만 집어넣어도 '아, 밖에 기차가 왔나?' 하겠지만
저 당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던 때지. 근데 '시선'을 통해 생뚱맞은 기차 도착 장면을 삽입 했음에도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하는데 당혹스러움이 없도록
잘~ 편집한거지.
이 역시 그리피스의 혁혁한 공이여.
또 다른 예를 들어보지


보이냐
기차에 빼곰이 등장하는 악당이 갑자기 두 배 커진 사이즈로 다시 등장하는 게
그런데 행동의 일치 때문에 편집이 그렇데 드러나지 않는 장면이다. 그러면서도 이 두 배 커진 사이즈를 통해 관객들에게 '이 새끼 이거 잘 봐두쇼'하는
각인과 소개의 효과를 주는거지. 그것이 바로 편ㅋ집ㅋ 인거제.
행동과 시선의 일치를 통한 편집점 감추기라는 건 창작자가 수용자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한 것은 물론
그 편안한 관람 속에서 자신이 취사 선택한 '컷'들을 의도적으로 내비추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제.
아 시발 중구난방 장난아니네.
오늘날이야 그리피스가 싸악 만들어 놓은 이 고전적 비가시 편집이 예능,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영상편집의 기초로 자리잡게 되어 영게이들에게 응당 그러한 것들이라 생각하는 건 말해 뭐하겠냐만,
그러니 새로울 것도 없고, 이런걸로 "어때? 어때?" 하는 나같은 놈 보면 호들갑 떠는 병신같이 보이겠지만...
1914년 즈음해 그리피스가 완성시킨 고전적 편집의 영향력이 오늘날의 영상문법전반의 산소같이 쓰인다는건 좀 호들갑 떨어도 괜찮지 않겠냐.
나중가면
저 영상문법의 기초적 편집은 영화가 발전할 수록 여러 편집기법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
(도전의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창작자가 수용자들의 사고를 대폭 줄여나간다고...)
그래도 이 고전적 비가시 편집이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건, 그 만큼 탄탄하다는 사실 아니겠냐.
솔직히 이 비가시적 편집 설명하려면 180도 법칙이니 30도 법칙이니 고전적 내러티브니 별 잡다한 걸 다 끄집어 들여야 하는데
그럴거 없이 멜리어스와 그리피스의 차이점만을 예로 들어 러프하게 접근해 봤슴.
다음엔 좀 제대로 정리해서 올릴게. 의욕만 넘쳐서 미안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