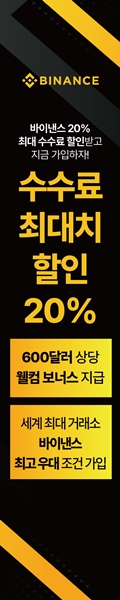백제의 시각에서 본 백제 멸망사 시리즈
[정보/스압/BGM] 백제의 시각에서 본 백제의 멸망사
제 1-1탄. 관산성 전투. 과연 신라의 뒷통수인가?
http://www.ilbe.com/1990768533
[정보/스압/BGM] 백제의 시각에서 본 백제 멸망사
제 1-2탄. 백제와 대가야 그리고 왜(倭)의 삼각동맹과 신라의 한성 점령
http://www.ilbe.com/2041803634
본격적으로 관산성 전투에 이번편 부터 들어갈거야.
솔직히 밀게 인구 대다수가 중,고딩이니 지금까지 쓴 글이 재미 없을거라 생각된다.
사실 밀덕후가 역사적 내용을 알아봤자 뭐하냐? 하겠지만 전쟁사는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거니 뭐... 어쩔수 없盧
이점은 다 이해해주리라 믿고 이번편도 재미있게 읽어주기 바란다.
흔히 말하는 관산성(管山城) 전투는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빼앗긴 백제가 신라에 대한 보복전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의 글을 읽어왔다면 신라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백제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한성 고토(古土)에서 백제는 자진 철수하였고 텅 빈 그 땅에 신라는 깃발을 꼽은 것이지.
어찌되었건 애시당초 나제동맹(羅濟同盟)의 고구려 공략의 밑그림은 한성 고토(古土)는 백제가 그리고 한강 중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기로 한 약속과는 어긋난 것이기에 백제 입장에선 신라의 배신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1차원적 시각이야. 백제 입장에선 한성 고토를 신라가 차지한 것도 차지한 것이지만 더 큰 눈에 가시는 신라와 고구려의 재결합이라 할 수 있지.
지금부터 백제의 신라에 대한 응징전쟁의 전개과정을 리얼하게 재구성토록 해 볼거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한국어판 위키백과를 한번 살펴보자.
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관산성 전투를 정의하고 있어.
-----------------------------------------------------------------------------------------------------------------------------------------------
관산성 전투는 554년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管山城,지금의 충북 옥천)에서 싸워 신라군이 백제군을 무찌르고 백제 성왕을 죽인 전투이다.
그 뒤 양국관계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적대관계가 계속되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 관산성 전투 中 정의 부분
날짜 : 552년
장소 : 신라 관산성(現 충청북도 옥천)
결과 : 신라군의 승리, 백제 성왕의 전사
참전국 : 신라 / 백제 가야 왜
지휘관 : 신라: 진흥왕, 김무력, 고간 도도 / 백제: 성왕, 여창
참전규모 : 신라(불명) / 백제(불명)
피해규모 : 신라(불명) / 백제: 좌평 4명,군사 2만9천600명 전사
관산성 전투는 기존의 연구에서 신라군의 극적인 승리로 간주되어 왔고 이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집혀 백제가 쇠퇴일로를 걸었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쟁의 발견>에서 이희진 교수는 초반 관산성 전투는 백제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관산성 전투에 대한 한 《삼국사기》보다는 《일본서기》기록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산성에 투입된 백제 주력군과는 함께 행동한 일이 없으며, 《삼국사기》에서 성왕이 데리고 갔던 50명은 성왕이 측근에서 움직이는 경호병력이자 성왕의 주요 측근들이었다. 얼마 전에 큰 전투를 치른 전장에서 불과 50명에 불과한 정도를 가지고 밤에 야습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측근까지 대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태자 창이 이끄는 백제 주력군에 의해 관산성이 함락된 직후 후방에서 호위병을 이끌고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내지는 전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산성으로 오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관산성 전투 발발 직후 신주군주 김무력은 증원군을 거느리고 백제군에게 반격을 가하려는 급박한 와중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백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삼국사기》에 "좌평(佐平) 네 명과 군사 29,600명을 목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3]라고 되어 있어, 당시로서는 대규모에 해당하는 3만이라는 수가 관산성에서 전멸했다는 《삼국사기》기록을 들어 백제가 입은 타격의 정도를 설명해왔지만, 같은 책 권41 열전1 김유신 상(上)에서는 "할아버지 무력(武力)은 신주도행군총관(新州道行軍摠官)이 되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왕과 그 장수 네 사람을 잡고 1만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4]고 하고 있어 수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1만 급이라고 기록한 것은 김무력 부대 자체의 성과이며, 여기에 다른 신라군의 성과가 합쳐진 숫자가 29,600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때 탐지, 우덕이 이끌던 신라군이 백제군에게 격파당한 상황에서 신라군 전력 가운데 백제군에 맞설수 있는 것은 김무력 부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김무력 부대 이외의 다른 신라군 부대가 1만에 준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집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왕의 목을 직접 베게 되는 비장 도도가 이끄는 삼년산성 병력도 전투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국한되어 동원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단한 군세라고 보기는 어려웠다.[5]
더욱이 관산성 전투 이후 신라에서의 논공행상 과정을 보면 신라군 지휘부의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신주군주 김무력의 행보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산성에서 백제군에 맞서 싸웠던 신라의 이찬 탐지는 일찍이 진흥왕 12년에 있었던 고구려 정벌에 잡찬의 지위로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산성 전투 이후로는 그 이름을 《삼국사기》안에서 더이상 찾아보기 힘든 데 반해 김무력은 이후로 승승장구하여 후손들까지 신라 조정에서 요직을 맡아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탐지가 김무력에 비해 관산성에서 별다른 공을 세우지 못했고 오히려 백제군에게 패배한 책임을 물어 실각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탐지나 우덕이 김무력에 비하면 별다른 공을 세우지 못했으며, 관산성의 신라군은 김무력의 군사와 합해 백제군에 대한 반격을 개시했다고 볼 여지도 없게 된다.
신주에 있던 김무력의 군대는 북방의 군사적 위치 때문에 관산성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대신, 관산성이 함락된 뒤 파병되었다. 관산성으로 이동하던 김무력 부대는 이동 과정에서 주변의 신라군까지 징집해 합류시키며 관산성으로 향했고, 삼년산성 군사들은 그때 합류한 부대 가운데 하나였다. 비록 신라군이 성왕의 관산성 행차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성왕을 잡아 죽였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성왕의 행보가 어떻게 신라군에게 입수되었는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성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지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수 없다.[6]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군이 입은 타격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 '기로(耆老)' 혹은 '노신(老臣)'으로 대표되는 백제 유력귀족들이 극구 반대하던 전쟁이었고, 이때 전쟁을 밀어붙인 것이 백제군을 최전방에서 지휘하던 창이었다. 전쟁을 반대하는 귀족들 앞에서 왕권의 입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도 성왕과 태자 창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성공시켜야 했다. 그런데 관산성이 이미 함락된 상황에서 성왕이 뜻하지 않게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죽고, 성왕뿐 아니라 성왕의 정책을 지지하고 추진할 측근, 《삼국사기》에서 '네 명의 좌평'으로 대표되는 요인들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고, 반대로 처음 전쟁을 반대했던 귀족들의 발언권이 관산성 전투를 계기로 한층 더 커지면서 백제의 왕권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대고구려전에 비중을 두던 백제의 정책기조는 관산성 전투를 기점으로 대신라전으로 옮겨갔으며, 이후 백제는 가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가야 지역은 신라에 합병되었다.[7]
한국어판 위키백과 관산성 전투 中 의의 부분
-----------------------------------------------------------------------------------------------------------------------------------------------
사료가 적다보니 남아있는 사료의 기록으로 어느정도 맞춘 기색이 역력해보이지 않盧?
이런자료를 읽고 나면 일반적으로 관산성 전투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기 쉬워

그림판 발퀼 ㅍㅌㅊ?
ㅆㅂ...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관산성 전투의 모순점 때문이야.
서양처럼 자세한 전투상황이 기록으로 내려오지 않는 동양에선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
10~20년전부터 전쟁사가들이 활발히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요 근래 베일을 벗는 전투도 생기고 있지.
관산성 또한 여러 전쟁사가나 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지만 딱히 명확하게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 못해.
그래서 나도 이러한 연구나 조사(?)에 동참하여 첫장에서 이 모순점을 다 밝히지 않고 하나하나 이 위키백과의 의의와 모순점에 대해 써내려가며 베일에 가려진 관산성 전투의 전모를 밝혀볼까해.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 중 환빠 다음으로 가장 싫어하는게 바로 '있는 사료를 고대로 믿는다' 야.
사료가 1개 뿐이라면 모를까. 2개 내지 그 이상이면 비교분석을 해야지 그냥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란 이분법적 사고논리에 휩사여 역사를 바라보면 안되.
특히 저번에 내가 국뽕을 치사량까지 쳐마시고 썼던 이순신 글에서 내가 이 오류를 범했으며, 상대방이였던 삼도XXXX 뭐시기 게이 또한 일본측 자료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치를 보이는 모습을 보며 나중에 해명글을 쓸때 씁쓸해했다.
뭐 아는게 나왔으니 둘다 흥분해서 그랬을거야ㅇㅇ 단지 반박글을 못읽어봐서 그 게이가 남기는 댓글로 대충 간추려서 올리긴 했는데 꽤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토론이 아닌 싸움을 거는건가 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은 개뿔 국뽕적 사고로 쓴 글과 출처 적지않고 긁어왔던 내가 잘못함ㅋ
무튼 관산성 전투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을 읽어왔다면 알겠지만 너무 부족해.
우리가 알고있는 가장 오래된 정사(正史)는 삼국사기인데, 그 결과만을 간략하게 언급 할 뿐 전개상황이나 주요 수치들이 나타나있지 않는 반면, 그보다 좀더 자세하게 기록한 일본서기 또한 관산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
그래서 2주전에 도서관에서 자료찾다가 걍 포기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향토민속구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봤는데 의외로 관산성 전투의 전개과정을 유추해볼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는게 여럿 보이더라구ㅇㅇ;
각 지역마다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관산성 전투 초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해.
또한 관산성(管山城) 전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준 지역을 서술해 보며 전투 직전 신라군과 백제군의 대치상황 또한 서술해볼께.
게이들은 충청북도 옥천군과 보은군에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盧?
이 지역은 지금으로 부터 약 1500년 전에는 삼국간의 명운을 걸고 크게 격돌한 지역이야.
그 결과 이 지역을 살펴보면 각각의 산등성이나 산 정상에 산성들이 쫙 깔려 있어. 현재도 발굴중인 산성이 있을 만큼 옥천과 보은 일대는 한국의 라인강이라고 할만큼 산성,성곽들이 많지.
관산성(管山城) 전투 직전의 당시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산성,성곽,토성 등등을 구글지도에 표기해봤어. 아래 짤을 한번 보자ㅇㅇ

새벽에 날라간거 80% 복구했盧... ㅠㅠ
딱 봐도 신라가 한성지역을 점령해 보인게 눈에 보이며 북한산 이북으로 고구려의 성곽들이 보이지?
그럼 다시 우리가 알아볼 관산성(管山城) 지역을 한번 확대해서 볼께.

전편에서 내가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 추측부분을 서술했던걸 기억하는 게이라면 지도를 보면 '아 그래서 그런 추측이 가능했던거구나' 할거야
관산성(管山城)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가면 바로 사비성(泗沘城)이 나오는걸 지도에서 바로 볼수 있을거야.
전 글에서 언급을 안했는데 사실 한성지역을 신라에게 강탈 당하면서 성왕이 신라의 배신을 알아차리진 않았어.
정확히 말하자면 신라가 한성지역을 점령하고 얼마 안가서 금현성(金峴城)과 도살성(道薩城)을 백제로 부터 빼앗아버리면서 성왕은 드디어 신라가 나제동맹을 파기시켜버린걸 알게 돼.
사비성(泗沘城)과 지척인 관산성(管山城)에 신라군이 병력을 증강시키자 백제는 부랴부랴 웅진,금산,논산,사비성의 주둔병력을 늘리기 시작하는데 아래의 짤이 바로 당시 그러한 상황을 나타낸 백제,신라군의 배치도야.

사실 지도를 보면 사비성(泗沘城)은 천연 해자인 금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소백산맥 줄기가 천연 성벽의 역활을 하고 있기에 그리 심각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비성으로 가는 루트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거야.

예상 공격루트는 3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 옥천 방어선을 돌파해서 대전 점령 -> 논산 -> 사비성으로 진군하는 루트
빠른 기동력을 발판으로 옥천방어선을 돌파해서 최단거리로 사비성(泗沘城)을 공략하는 루트야
하지만 사비성 주변에는 금강이라는 천연 해자가 존재하며 주변에는 견고한 성채와 산성,토성들이 감싸고 있는 방어구조이기에 신라군이 쉽사리 넘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웅진성(熊津城)과 봉곡산성 주둔군이 후방을 공격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흐름을 보이게 될거같아.
두번째. 옥천방어선을 돌파해서 대전 점령 -> 금산을 점령-> 논산->사비성로 이어지는 루트
이 루트는 사비성(泗沘城)을 공략하는건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큰 이득은 백제의 경제,군사 요충지인 금산을 점령하여 백제를 압박하는 전술이야.
지도를 봐도 알겠지만 금산을 점령하면 소백산맥으로 인해 백제가 쉽사리 수복하기 힘든점이 있지.
하지만 이 금산(錦山)은 백제의 말 생산지 중 하나로서 대규모 중장기병을 운용하는 주력군이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루트가 되지만 점령만 한다면 한성지역을 잃고 휘청거리는 백제를 일격에 한반도의 병자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번째. 옥천방어선을 돌파해서 대전 점령 -> 웅진성 공략 -> 사비성
이 루트는 천안(天安) 방어선에서 내려오는 적을 붙잡기 위해 웅진성을 공략하는거야.
여기서 2개의 루트로 또 나뉘는데 3-1은 웅진성(熊津城)을 공략한 후 금강을 타고 내려가 사비성(泗沘城)을 공격하는것이고
3-2는 웅진성(熊津城)에서 바로 논산(論山)으로 내려가 사비성(泗沘城)을 공략하는거지 하지만 3번 루트는 딱 봐도 알겠지만 작전이 실행되기 난감하므로 가능성이 없지만 한번 넣어봤어.
이래나 저래나 관산성에 신라군이 대규모 병력증강을 하니까 백제가 압박받는걸 알 수 있겠지?
관산성 전투를 조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 냈어.
사실 이 옥천(沃川)의 신라의 산성과 보루들은 대부분 백제가 축조했었는데 신라가 가져가 버린거지.
나제동맹(羅濟同盟)은 약 100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 신라가 옥천 지역에 진출했었나? 하고 의문이 드는 게이가 있을거야.
그럼 신라는 옥천 지역인 관선성에 언제쯤 진출하였을까?
신라 산성의 특징은 배후에 신라군의 사령부라 할 수 있는 보은군 삼년산성(三年山城)을 배후로 금강까지 점차적으로 진출하면서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의 영역을 점점 확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 옥천(沃川)과 보은(報恩)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도 19번 국도가 이용되는데 그 라인 상으로 이름 모를 산성(山城)이 많이 있어. 신라의 영역이 점차로 백제 진영까지 내려오면서 금강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의 새로운 국경선으로 상당기간 안정화 되었을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을거야.
그 이유는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 시절 본격적인 충돌전까지는 나제동맹(羅濟同盟)은 거의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신라의 전초기지인 보은에 삼년산성을 서기 470년인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3년에 쌓았을 때도 신라와 백제간은 충돌이 없었어. 또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다음 왕인 소지 마립간(炤知麻立干) 때인 서기 486년에 수리했다고 나와.
이 삼년산성(三年山城)은 고구려를 대비해서 세워진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발판이 되는 성이야.
일단 성이야기가 나왔으니 유명한 삼년산성(三年山城)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시작해보자ㅋ

삼년산성 (三年山城)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있는 사적 제 235호인 삼년산성(三年山城)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는데 발판이 된 그런 산성으로서 축성시기는 서기 470년 신라 자비마립간 13년이라고 위에서 언급했지?
삼년산성(三年山城)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다 알겠지만 3년만에 축성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내외벽 모두 돌로만 축성한 완전한 석축의 산성의 모습을 보여. 당시 장수왕의 남하정책에 대비하여 쌓아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삼년산성(三年山城)은 보기드문 요새야.
그 후 서기 486년인 소지마립간(炤知麻立干) 8년 이찬(伊飡) 실죽(實竹)이 일선(一善 : 現 경상북도 구미)지방에서 3천명의 인부를 징발해서 개축하였다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엔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통일 전쟁기인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654~661)이 당나라 사신 왕문도(王文度)를 이곳에서 영접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삼년산성(三年山城)의 내부 시설물과 외부 지표유적에 관한 조사 결과
삼년산성(三年山城)은 신라가 對 백제전을 벌이는데 있어서 중심이 된 산성이자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서서 교두보(橋頭堡)로서 마련한 산성이라고 앞선 글에서 조금 언급했을거야. 이 산성은 워낙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라서 별도로 다루고자 해서 적어 봤어.

위에서 바라본 삼년산성 (三年山城)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전쟁에서 삼년산성(三年山城)은 신라 북방전선의 총지휘본부이자 문경(聞慶)의 고모산성(姑母山城)과 더불어 보급기지 역할을 한 산성(山城)으로 보여져. 또한 관산성(管山城) 전투 당시 백제 총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태자 여창(餘昌)의 본부인 환산(環山 : 고리산)의 위치와 전투 격전지의 전개양상을 볼때는 백제의 공격목표는 바로 이 삼년산성(三年山城)이 아니었나 하고 난 추정해.

삼년산성 성벽 단면도
삼년산성(三年山城)은 포곡형(包谷形)으로 구들장처럼 납작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井자 모양으로, 한 켜는 가로쌓기, 한 켜는 세로쌓기로 축조하여 성벽이 견고해. 석재는 대개 장방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축조하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 13∼20m에 달하며 거의 수직으로 쌓여 있어 꽤나 높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삼년산성 성벽단면도 / 아래에 4중 계단식을 확인 할 수 있음
이처럼 성벽이 높고 크기 때문에 그 하중도 막대하며, 성벽 모퉁이의 하중이 큰 부분에는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4중의 계단식으로 쌓은걸 볼 수 있어.
동쪽과 서쪽의 성벽은 안으로 흙을 다져서 쌓았고, 바깥쪽은 돌로 쌓는 내탁외축(內托外築)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남쪽과 북쪽은 모두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알려져 있어.

삼년산성 평면 실측도
문지는 동서남북의 네 곳에 있으나 지형상 동문과 서문을 많이 이용한 듯하며, 그 너비는 대개 4.5m에 달해. 수구는 지형상 가장 낮은 서쪽 방향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쪽에는 지상에서 약 1m 되는 성벽부분에 65×45㎝의 5각형 수문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는군ㅇㅇ
한편, 7곳의 옹성은 대개 둘레가 25m, 높이 8.3m로서 지형상 적의 접근이 쉬운 능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축조하였는데, 우물터는 아미지(蛾眉池)라는 연못을 비롯하여 5곳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주위의 암벽에는 옥필(玉筆),유사암(有似巖),아미지 등의 글씨가 오목새김되어 있는데 김생(金生)의 필체로 전해지고있어.

삼년산성 서문터 상대 초석 실측도
1980년 7월 22일 호우로 인하여 서문지 부분이 무너져내리고 유구(遺構)가 드러나 발굴한 결과 성문에 사용했던 신방석(信枋石)과 주춧돌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성문은 신라의 상대(上代)와 하대(下代)에 축조되었고 상대 문지의 문지방석(門地枋石)에 수레바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분석한 결과, 중심거리가 1.66m에 달하는 큰 수레가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어.
특이할 만한 것은 김헌창(金憲昌)의 난의 거점지로 이용되었으며, 태조 왕건(王建)도 이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점령하려다가 크게 패한 이력이 있는 산성이야.
딱 봐도 꽤나 견고할거 같은 성 같지? 지금도 삼년산성의 개,보수 작업이 한창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한번 삼년산성에 들려서 한번 산책해보는건 어떨까 싶盧ㅋ
무튼, 이 기록을 통해서 신라가 금강 언저리인 굴산성을 수리하고 주둔할 때까지만 해도 백제와 신라간에는 충돌이 없었고 고구려에 대항하는 나제동맹(羅濟同盟)은 원활하게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다가 신라가 백제의 바로 코앞인 옥천(沃川)분지까지 진출해서 관산성,서산성,삼양리 토성까지 차지하게 되자, 그 때부터 서서히 백제가 신라의 저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고 추측 해봤어. 왜냐하면 금강 북동쪽 보은(報恩) 방향의 신라 산성은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군사시설로 볼 수 있으나 백제의 코앞인 구건리 산성이나 지탄리산성,이원리산성 등은 고구려의 남하보다는 백제에 대한 견제차원의 산성으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삼국사기 동성왕 23년 7월 기록에는 “7월, 탄현(炭峴)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라고 적혀 있어. 동성왕 시기는 백제의 수도가 지금의 공주(公州)인 웅진(熊津)이던 시절이지.

백제가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을 잃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웅진시절 백제는 정변이 그만큼 많았던 시절이었어. 동성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무령왕 치세에 잠시 안정을 취했지만 웅진백제는 고구려만을 신경써도 힘든 판국에 동성왕이 탄현에 고구려가 아닌 신라에 대비해서 탄현(炭峴)에 목책을 설치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겠盧? 그런데 이점에 대해 기존의 역사서에선 간과하고 그대로 넘어간 면이 없지 않은거 같아.
간접적으로 금강을 넘어서서 관산성, 즉 옥천(沃川)일대까지 신라가 진출한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동성왕(東城王)때 탄현(炭峴)에 목책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됨으로써 신라 백제의 국경선이 금강과 보청천을 따라 형성되던 것이 관산성(管山城) 바로 앞을 흐르는 서화천, 즉 백제 성왕이 죽은 구천 일대의 개천을 경계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
대충 관산성(管山城) 전투가 벌어진 지역의 그림이 잡히盧?
잡혔다고 이해하고 그럼 위키백과에서 안나온 부분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자ㅇㅇ
그전에 위키를 본 게이도 있겠지만 너무 부실한 나머지 걍 성왕이 뒤져서 진거 아님?? 하는 게이도 있을거야.
나도 관산성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 그래왔으니까ㅇㅇ
그래서 내가 여러 기록을 다 찾아서 당시 참전했던 지휘관들을 일일이 대조해서 사실여부를 따졌어.
그 결과가 아래와 같아. 참고로 병력추정치는 밑에서 왜 이런 추정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글을 서술하면서 쓸거니까 오해ㄴㄴ해.
신라(新羅)
신라군 총사령관 : 병부령(兵部令) 이사부(異斯夫) - 진흥왕이 무슨 총사령관인지 원
관산성 방면군 사령관 : 이찬(伊湌) 탐지(耽知)
삼년산성 방면군 사령관 : 파진찬(波珍飡) 거칠부(居柒夫) ※실질적인 관산성 전투의 지휘관
상주 방면군 사령관 : 상주행군대총관(上州行軍大摠管) 각간 우덕(于德)
신주 방면군 사령관 : 신주도행군총관(新州道行軍摠管) 아찬 김무력(金武力)
관산성 방면군 : 5,000(추정)
삼년산성 방면군 : 10,000(추정,삼년산성 주둔군은 꽤 높은 비율로 중장기병을 운용했을 가능성이 농후)
상주 방면군 : 10,000 (추정)
신주 방면군 : 5,000 ~ 7,000 (추정)
※관산성은 앞서 설명한 대로 신라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병력주둔이 높았을거야. 특히 관산성 방면군 사령관인 탐지의 관등이 이찬(伊湌)인 것을 볼때 대략 4,000~5,000명으로 추산이 가능해. 또한 삼년산성은 신라의 對 고구려 방어의 중심이였기 떄문에 그 병력 또한 만만치 않았을거라 추정 할 수 있는데, 특히 파진찬 거칠부(居柒夫)는 고령인 이사부를 대신하여 신라군 전체를 통괄하고 있었으며, 신주방면으로 진출한 신라군의 주요 보급로이자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백제군 까지 방어해야 되는곳이기 때문에 삼년산성 주둔군은 대략 10,000명으로 추산 할 수 있어. 또한 이 삼년산성은 앞서 설명했지만 對 고구려 방어시설이였기 때문에 고구려 중장기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신라의 중장기병이 높은 비율로 주둔했을 가능성 또한 매후 농후하지.
상주방면군 또한 설명을 하자면 진흥왕 11년인 서기 550년에 영토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각 주마다 군단을 주둔시키기 시작했는데 비록 이때는 신주,하주,상주 3개의 주만 있었어. 특히 상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주를 컨트롤 하기 용이 했는데 이 상주에 군단 최고 책임자를 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주행군대총관이야. 그러므로 우덕의 관등이 각간(于德)인것을 볼때 상주군단의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을거야. 그러므로 상주방면군 또한 못해도 10,000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또한 신주방면군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군사 1만을 근거로 관산성 전투의 급박함으로 인해 각 성을 방어할 최소한의 병사를 뺀 병력동원 최대치를 추정해서 산출했어. 그 결과가 5,000~7,000명이야.
참전병력 : 30,000 ~ 35,000
백제(百濟)
백제군 총사령관 : 태자 여창(餘昌,훗날 위덕왕)
연합군 총사령관 : 백제 성왕(聖王)
좌평 4명, 달솔 5명 위시 좌평 1명 , 친왕파 귀족과 반대파 귀족들
백제 중앙군 : 2,500
국왕 친위대 : 500 ~ 1,000 (추정)
백제 주력군 : 21,000 ~ 22,000 (징집병,친왕파 사병들 포함)
※백제의 중앙군은 소위 5부으로 나뉘는데 각 방에는 500명씩 있었으므로 총 2,500명으로 추산 가능해. 또한 위시좌평이 국왕의 친위대를 지휘하므로 못해도 500 ~ 1,000의 친위군이란 추정치가 나올수 있어. 그리고 백제 주력군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비성 인근의 백제군 주둔지인 울성산성,봉곡산성,성흥산성,주류성에서 이끌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의 규모를 추측해볼때 대략 2만명의 규모의 추정치를 낼 수 있어.
참전병력 : 25,000
왜(倭) (동방령군東方領軍)
동방령군 장수 : 야마타이국(邪馬臺國) 유지신(有至臣) / 구주(九州)의 막기무련(莫奇武連)과 막기위사기(莫奇委沙奇) / 축자국조(筑紫國造) 안교군(鞍橋君)※
참전병력 : 1,500 ~ 2,000 (구주연합군,가야도래계- 대부분 궁병,경장보병이였을 가능성이 높음)
※병력추정치에 관해서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근거로 유지신이 이끌고온 1천명과 그전에 이미 산성 수축을 위해 넘어온 왜(倭)인 300~500을 근거로 추정했어.
※筑紫國(축자국), 筑紫國造(축자국조), 國造 (倭國造 手彦, 火葦北國造 阿利斯登의 아들 達率, 紀國造 押勝) 라고 일본서기에 기록되있으며
또한 일본서기 권20 渟中倉太珠敷天皇 敏達天皇12년 기사에서
臣連。二造。〈二造者。國造。伴造也。〉
조정에 있는 臣.連의 二造로부터<二造란 國造와 伴造이다>
라고 기록되어있는걸 볼때 축자국조는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왜군 장수 이름이 아니라 축자국의 반조가 아닌 국조(國造)라는 관등(벼슬)을 지녔던 장수라고 해석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름이 불분명한데, 관산성 전투 하이라이트인 백골산 전투에서 태자 여창이 축자국조로 인해 활로를 뚫고 퇴각한 후 그의 활쏘기가 신묘하다고 해서 이름을 하사했던 안교군(鞍橋君)을 그냥 이름으로 설명했어.
또한 국조(國造)는 일본말로 구니노미야스코로 불리우는데 이건 야맛토 조정에서 지방의 유력한 호족에게 주던 관직이자 지방의 군주이므로 당시 왜(倭)군에 야맛토조정의 고위관료들이 참전했을거란 추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 가야와 왜(倭) 간의 한반도 도래인의 관계를 살펴볼때 이 축자국조는 가야 도래계일 가능성이 농후해.
참고로 반조(伴造)는 조정의 관리이자 도모(伴)라고 하는 세습적 집단과 도모베(品部)라는 직업베민(직조기술자)을 거느리고 제사 등의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관료야.
나중에 고대 한일관계의 Missing Link를 설명할 때 서술하겠지만 이 직조기술 또한 가야, 금관가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반조라는 직책 또한 가야 도래계가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ㅇㅇ;
대가야(大伽倻)
대가야군 사령관 : 월광태자(月光太子) or 대장군 (개인적인 추측)
※추측해보자면 참전병력을 생각해 볼때 대가야 국왕보단 왕자가 이끌고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추측하자면 대가야군의 지휘관은 대가야 제 16대 왕이자 마지막 군주가 되는 월광태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고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걸 보면 대장군급이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음.
참전병력 : 5,000 ~ 10,000 (추정,대부분이 중장기,보병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
※일본 궁내청 보관 삼국사기에서 성왕이 보기 5천을 이끌고 가다 구천에서 복병에 걸려 전사한 기록을 가지고 추정치를 냄
대가야 또한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얼마 안가 신라군 선봉 5천에 멸망하는걸 볼때 국력을 총동원해 병력을 파견했을것으로 추정해서 추정치를 냄
또한 기타 전승이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던 대가야의 병력이 대략 10,000 이라는 수치도 보이므로 추정치를 산출함.
연합군 총 병력 : 35,000 ~40,000 (추정치)
어느정도 관산성(管山城) 전투의 윤곽이 하나씩 잡혀가盧?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산성 전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볼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관산성 전투의 상황도야.

이제 얼추 상황도가 윤곽에 잡히지 않盧? 관산성에서 신라군의 움직임이 딱!딱! 보이지??
근데 전글에서도 대충 서술했지만 왜 백제의 주공(主攻)은 한성지역의 신주(新州)가 아니라 관산성(管山城)이였을까?
단지 한성 고토 회복 작전이 목적이었다면, 백제는 응당 신주(新州)의 김무력(金武力)을 공격함이 순서이겠지만 백제의 주공은 한성땅이 아니라 옥천(沃川)지역이었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