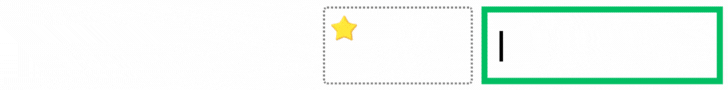찢째명이 뜬금포로 문화·예술계를 돕겠다며 원포인트 추경 이야기를 꺼냈다. 문화예술 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 협력도 미흡해, 문화예술계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진단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우기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거다. 그런데 이 논리는 시작부터 어딘가 어색하다. 한국의 문화예술이 언제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 속에서 자라났던 적이 있었나?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다. 제도도, 예산도, 보호도 없이 각자도생하던 창작자들이 판을 키웠고, 성과가 보이자 정치가 뒤늦게 이름표를 붙였을 뿐이다.

K컬처의 성장사를 ‘행정의 부재’로 설명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것 이거나 의도적인 재해석이다. 더 불편한 지점은 과거와의 연결선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화예술계 개입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었다. 당시 많은 좌빨 연예인들이 피해자를 자처했고, 정권의 문화 정책은 절대 악처럼 규정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그 논리는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는 ‘지원’과 ‘보호’라는 말로 같은 구조가 다시 등장한다. 방식은 비슷한데, 명분만 바뀐 셈이다.

이런 시점에 문화 관련 공공기관 인사를 구마적으로 앉힌다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다. 문화예술 지원을 명분으로 한 추경, 그리고 그 추경을 집행할 기관의 권한 강화. 공교롭게도 흐름만 놓고 보면 우연이라고 가정하기엔 지나치게 매끄럽다. 특히 지금은 군(軍)을 포함한 필수 영역조차 예산 집행이 안돼 당나라 군대 다됐단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 그런데도 정말 급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은 의도적으로 비켜 가고 뜬금없이 추경이다.

정책은 늘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에는 흔적이 남는다. 문화예술을 위한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이 방식인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추경은 ‘지원’이 아니라 ‘보답’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처럼 말이다.
아무튼 블랙리스트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정권만 잡으면 아무렇지 않게 자신들과 동색인 새로운 명단을 만들고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요직을 찾이하면서 그들만의 영역을 공고히 확립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이라 떠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