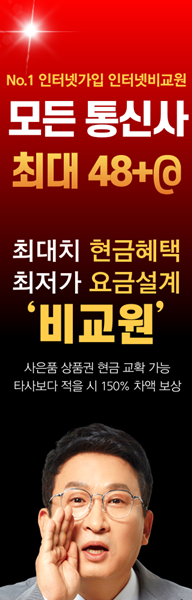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배터리 폭발 예방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대폭 늘려 한국과 격차를 약 두 배로 벌렸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수조에 담겨 있는 모습. / 뉴스1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배터리 폭발 예방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중국이 한국과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기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졌지만,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특허 경쟁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저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두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리튬이온배터리의 고질적 약점인 폭발 예방 기술에서마저 중국에 뒤처질 경우, K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지식재산처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까지 배터리 폭발 예방 관련 특허 출원에서 세계 1위(173건)를 기록했지만 2015년부터 중국(231건)이 한국(121건)을 추월하며 역전이 시작됐다. 최신 집계인 2023년 통계에선 중국의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2195건으로 한국(1219건)의 약 1.8배에 이른다. 2004~2023년 20년간 누적 출원 점유율을 보면, 중국은 48.9%, 한국은 24.3%로 격차가 확연하다.

中, 2015년부터 韓 추월
리튬이온배터리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핵심 부품이다. 현 정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전을 선언했다. 향후 ESS 설치 수요도 급증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사용량도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처럼,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당시 화재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지만, 완전 진화까지 22시간이나 걸렸다. 배터리 화재를 완전 진화하려면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행정 시스템 상당수가 장시간 셧다운 되는 후폭풍이 뒤따랐다.
“폭발 리스크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관건”
결국 배터리의 폭발 관련 리스크를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가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 경쟁 2차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특허 출원이 기술 품질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출원 건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표”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ESS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배터리 화재를 줄이는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중국의 LFP 배터리도 십수 년 전 대량 특허 출원에서 출발한 기술”이라며 “중국이 지금 쏟아내는 배터리 폭발 예방 관련 특허들이 10년 후 실제 제품으로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부의 내년도 배터리 관련 R&D 예산은 446억원이다. 이철규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등 배터리 폭발 사고가 막대한 국민적 피해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배터리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술 분야마저 중국에 우위를 내줬다”며 “정부는 화재·안전성 관련 기술 분야의 맞춤형 지원 전략을 통해 K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