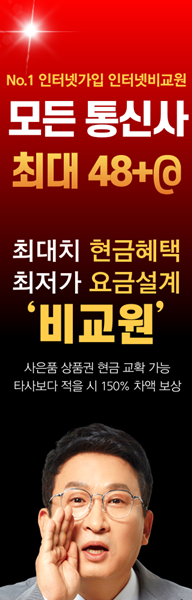몇달 전 패트릭 맥기(Patrick Mcgee, 前 파이낸셜타임스(FT) 애플 담당 기자)가 펴낸 신간 '애플인차이나Apple in China' 는 출간 직후 미국 업계와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소감은 한국에서도 꼭 심층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번역 에이전시가 있으면 꼭 번역 부탁드립니다. 번역자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간 심증만 있다고 추정되던 미국 기업과 중국 정부 사이의 협력 구도에 대한 의심이 사실에 가까웠다는 증거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의심은 미국의 주요 테크 업체들이 지난 10-20년 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아예 중국의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와 최근에는 AI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산업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애플의 케이스에 국한되었긴 했지만, 맥기 기자의 책에서 낱낱이 그것이 사실에 가까웠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맥기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한 애플의 사례는 애플의 아이폰, 맥북 등의 제조 협력사인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대만의 IT 제조 전문사들과의 관계부터 시작한다.
애플과 이들 대만 협력사는 중국 현지에서 BYD, Luxshare 등 중국 본토 EMS 방식으로 에어팟부터 아이폰까지 광범위한 애플 제품을 같이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 고유의 생산관리 노하우는 물론, 공정 기술, 품질 관리, 납기체계 관리 등의 노하우가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uxshare는 Wistron 중국 공장을 인수하여 제2의 폭스콘으로 성장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같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관련 기술도 중국으로 꽤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iCloud 중국 데이터 서버는 2018년 2월 28일부로 GCBD(Guizhou-Cloud Big Data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GCBD가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지분을 갖는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팔리는 애플 제품의 모든 클라우드 백업 정보는 사실상 중국 정부 소유가 된 셈이다. GCBD를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관은 물론, 검열, 접근 통제 체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 간 애플이 중국에서 일으킨 매출은 실로 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4년 기준으로, 애플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은 애플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한다. 특히 아이폰은 20-25%, 앱스토어 매출도 20% 이상으로, 애플에게 있어 중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Cloud 서버 제어 권한을 중국 정부에 넘기는 것은 물론, 애플 제품의 생산 파트너를 대부분 중국 업체들로 바꾸는 것에도 자의 반타의 반 동의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애플의 기술뿐만 아니라, 애플이 그간 협력하던 다른 회사, 특히 심지어 다른 나라의 반도체 및 IT 제조사들의 기술도 같이 알게 모르게 넘어갔을 기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폭스콘의 기술이 Luxshare로, 삼성디스플레이나 LGD의 기술이 BOE로 새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때 애플의 파트너였던 두 회사의 OLED 등의 기술이 일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그러한 가능성의 일부일 뿐이다.
애플은 현지 공정 개선이나 DFx(Design for X) 등의 전략을 중국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중국 엔지니어와 상주형 문제 해결 루프를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 관리 노하우(도구 세팅, 라인 튜닝, 수율 관리 등)가 중국 EMS 파트너, 부품 공급사 등에 전수되어 축적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애플이 중국을 훈련시킨 셈이다.
맥기 기자가 책에서 지적하듯, 애플이 중국에 대해 집중 투자한 결과물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에 반도체-IT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주었고,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중국 정부가 막 융성하던 첨단 산업 생태계 초기부터 통제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애플뿐만이 아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오픈소스로 확장된 것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구글이 2015년에 공개한 TensorFLow, 메타의 PyTorch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초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었다. 특히 화웨이는 2019년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메타의 PyTorch Foundation에 프리미어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화웨이의 초기 AI 전용 NPU인 어센드 설계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했다.
오픈소스로 출발한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커뮤니티의 초반 방향에서 정부가 사실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초기에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 방향이 확정되기 전, 중국의 여러 업체들은 빠르게 이 생태계의 주요 멤버로 참여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IT 업체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중국 내 반도체 및 인공지능 생태계를 자급화한다는 명목 하에 합작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오픈한 바이두의 PaddlePaddle은 정부-대학-회사가 한 팀을 이루어 PyTorch 같은 오픈소스를 만들려던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미국의 주요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노리며 10-20년 간 깔아 둔 자본, 기술적 기반, 경영 전략의 전수, 인재 훈련 시스템 등은 그대로 중국 업체들에게 흡수되면서 사실상 미국은 최대의 적을 스스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MS가 2000년대부터 운영한 Microsoft Research Asia(MSRA)는 중국 내 최고의 IT 연구 인력 산실로 기능해 왔으며, 이 연구소를 거친 alumni 들은 빅테크의 주요 임원으로, 스타트업 창업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핵심으로 진출했다.
예를 들어 Kai-Fu Lee는 MSRA의 공동 설립자이자 구글 차이나 사장을 역임했고, 현재은 Sinovation Venture 회장이다. Ya-Qin Zhang은 MS China 임원을 역임했고, 2014-2019 바이두 사장으로 재임했으며, 현재는 칭화대 AI 산업연구소 책임자다. MSRA 초기 멤버인 Hongjiang Zhang은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BAAI 설립자다.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에서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로 일하는 Weiying Ma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MSRA에서 머신러닝 연구를 했던 엔지니어이기도 하다. MSRA 역시 오픈소스 협업을 기반으로 했는데, 그 문화는 중국의 연구자들에게 그대로 이식되었다.
퀄컴의 경우,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기에 핵심 IP와 칩셋을 공급하면서 중국 시장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가 퀄컴과 초기부터 HW, RF 체인의 파트너사로 참여하면서 이들의 자급화에 도움을 준 셈이 되었다.
퀄컴 입장에서도 2024년 기준으로, 중국 고객 비중이 자사 매출의 46%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국과의 협력을 줄이기도 어렵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인텔도 이미 2014년 칭화유니에 모바일 생태계를 가속한다는 명분으로 15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칭화유니의 메모리반도체 기술 개발 자금으로 쏠쏠하게 활용되었다.
IBM 역시 2007년부터 중국 반도체 팹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미 2007년, IBM은 현재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사가 된 SMIC에 당시로서는 최신 공정이었던 45 나노 공정 라이선스를 기술이전하면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격차를 줄이는 면에 초기에 한몫했다.
클라우드 측면에서도 애플만이 중국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zure(21Vianet)이나 아마존의 AWS(Sinnet/NWCD) 역시 클라우드의 분리운영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현지에서의 운영권을 현지 파트너에 이양하는 구조로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했다.
중국 정부는 iCloud에 했던 방식 그대로, 미국 IT 업체들의 클라우드 서버와 그 내부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리, 보관, 검열 등의 막대한 권한을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워 이양받았다.
흥미롭게도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권한만 이양받은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운영 및 구축 기술(가상화, DevOps, SRE, 보안, 규제 컴플라이언스 등)도 같이 확보했다.
이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최근에는 바이트댄스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기술 인력에게 사실상 교육-전수되는 플랫폼이 되었다.
이러한 지배력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주요 반도체, IT, AI 업체들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지난 10-20년 간, 미국의 주요 IT 업체들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중국에서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중국 경쟁자들의 가장 중요한 인큐베이션 역할을 한 셈이다.
적어도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궤도에 본격 진입하는 중장기까지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로 제조 운영능력의 외주화 한 것은 사실상 중국 현지 업체로의 기술 전수(OPS, QE, SCM 등)와 구분되기 힘들어졌고, 오픈소스로 시작한 AI 스택의 광범위한 보급은 중국판 AI 모델 개발 및 혁신 저변 확대로 이어졌으며, 중국에 설립한 연구 및 교육 기관은 중국 경쟁사에서 일할 연구원이나 창업자의 요람이 되었고, 엔비디아의 GPU는 성능 열화와 수출 물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같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AI 모델 개발 경쟁자가 등장하도록 만드는 촉매가 되었으며, 클라우드 운영은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사실상 데이터 활용과 노하우를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까지 전수하는 결말로 이어졌다.
사실 이러한 사례와 이후 이어진 결과의 파급력이 미국의 굵직한 IT, 반도체, AI 업체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것이다.
애초에 이들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였고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기였던 동시에,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 수준은 중진국 미만의 상황이라, 당시의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렇게 빨리 자신들을 위협할 부메랑이 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는 미국 정부가 딱히 중국에 대해 기술 규제를 하거나 무역 제재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자 저렴한 제조업 공급기지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그리고 합자 러시를 막을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미국의 기술 요소 하나하나를 빠르게 흡수하고 자국 시장에 맞게 최적화한 중국 업체들의 성장 속도는 너무 빨랐다는 것이 문제였다.
2024년에 미국 의회의 미-중 전략경쟁위원회(The 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nunist Party)에서 출판된 'The CCP's Investors: How American Venture Capital Fuels the PRC Military and Human Rights Abuses'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반성이 여러 곳에서 잘 분석된 문건이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주요 업체들의 기술 이전 및 중국 내의 첨단 산업 인큐베이션 과정에서, 미국의 자본가들, 특히 민간 펀드 기반 VC가 어떻게 이 과정의 촉매가 되었는지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주로 보는 VC는 5곳으로서,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이나 기관, 특히 반도체와 AI 사업 분야에 투자한 누적 투자액만 따져도 최소 30억 달러다. 보고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투자가 단순히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중국 기업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들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일부는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VC들이 투자한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 여느 VC가 그렇듯, invest & forget 하는 기관은 없다. 특히 큰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이 제대로 수익 창출로 활용되는지를 VC는 계속 감시하는데, 중국 기업들에 투자한 미국의 VC는 그 이상의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중국 내에서의 수익 창출 보장을 위해, Walden Int'l 같은 펀드 회사는 아예 투자한 회사의 이사회에도 참여하는가 하면, 기술이나 경영 멘토링(이라고 쓰고 컨설팅이나 지도라고 읽음)도 하고, 필요하면 그를 담당할 수 있는 미국 내 파트너사를 연결해주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VC의 지원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일부 VC 들은 투자한 회사 관리라는 명목 하에, 중국의 기업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기업, 인민해방군과 연루된 기업에 직접 관여하여 미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기술적 난제 해결, 솔루션 지원 등의 협력까지 제공한 셈이다.
반도체 쪽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IBM이 기술이전한 SMIC가 대표적 사례다.
SMIC가 2010년 들어,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로직 반도체 생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높은 CAPEX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VC가 초기 자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SMIC의 성장 기반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Walder Int'l 같은 VC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들은 2001년부터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2001-2018년 사이 SMIC의 이사회 멤베로도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현 CEO 인 립부탄도 이사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AI 산업에서도 미국 민간 VC의 역할은 지대했다. 중국 AI 업체들 대다수는 크든 작든, 미국 VC 자금을 받았고, 특히 AI 반도체 업체들인 바이런이나 무어쓰레드 같은 업체들에도 VC의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데, 문제는 이들 AI 반도체 업체들이 202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제재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들 AI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넘어, 중국 공산당이 큰 지분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군사용 AI 반도체 생산도 담당하는 업체라는 점 때문이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확산에서도 미국 VC의 역할은 지대했다. 세쿼이아(Sequoia) 같은 경우,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에만 14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바이트댄스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 연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자본력만 뒷받침한 것이 아니라, 세쿼이아 같은 글로벌 VC가 투자한 회사라는 위명을 등에 업고 글로벌 진출을 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권석준교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