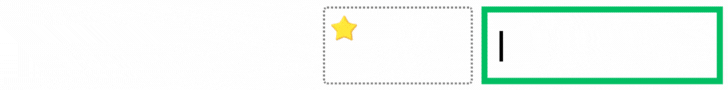**국민의힘은 고장난 게 아니다.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다.**
3당 합당 이후 한국 보수 진영은 키메라가 됐다. 군부 시절의 성과 서사는 갖다 쓰면서 실제 작동 원리는 신자유주의로 갈아탔다. 이건 사상적 혼선이 아니라 진영 장악의 결과물이다. 처음부터 일관된 사상을 공급할 의도가 없었던 집단이 보수의 외피를 뒤집어쓴 것이다.
그 결과 이 진영의 지지자들은 자기 정서를 언어화할 도구를 한 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 전통과 축적된 질서에 기대려는 욕망, 검증되지 않은 변화보다 지금의 것을 지키려는 본능 — 이건 경솔함이 아니라 보수주의의 오랜 직관이다. 근데 그걸 스스로 언어로 설명할 기반이 없으니 매번 "저 사람이 우리 편"이라는 인물에 투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구조를 안다. 그래서 인물을 공급한다. 인물이 배신하면 지지자들의 분노는 당 구조가 아니라 그 개인에게 쏠린다. 당은 살아남는다. 다음 인물을 공급한다. 사이클이 반복된다.
한동훈에게 속았다고, 장동혁한테 배신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 틀린 말이 아니다. 근데 그 분노의 방향이 틀렸다. 뱀을 키우는 생태계를 그대로 둔 채 뱀 개인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다음 뱀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왜 지속되는가. 지지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기댈 데가 없어서다. 출구가 없으니 입구로 다시 들어온다. 이건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라 구조적 포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포획 구조 위에서 먹고산다. 지지자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대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혁신할 이유도 없고, 사상을 공급할 이유도 없고, 인물을 제대로 검증할 이유도 없다. 배신이 반복돼도 당은 건재하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뀐다. 김문수가 왜 저랬냐가 아니라 — 저 당에 발을 들이면 왜 다들 저렇게 되냐가 맞는 질문이다. 멀쩡한 사람도 저 구조 안에 들어가면 엔추파도스가 된다. 이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환경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개혁을 외치는 인물이 들어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엔추파도스가 되거나, 잘려나가거나. 장동혁이 전자였고, 민경욱이 후자였다. 이 진영 지지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 —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 을 끝까지 제기한 인물이 당에서 튕겨나갔다. 지지자의 핵심 정서에 가장 충실할수록 오히려 제거되는 구조다. 이 당이 누구의 대리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한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그를 뱀이라 보지 않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구조에 한 발을 들이는 순간 — 지금까지의 관찰값은 냉정하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순진한 자도, 충실한 자도, 결국 그 구조가 요구하는 모양으로 깎여나간다.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구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개혁 대상이 아니다. 해체 대상이다.
개혁이 가능하려면 내부에 개혁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당은 구조적으로 그 동력을 소화하지 못한다. 충실한 자는 잘려나가고 영리한 자는 엔추파도스가 된다. 예외가 없다.
지지자들에게 필요한 건 다음 인물을 고르는 안목이 아니다. 인물을 고르는 행위 자체를 멈추는 것이다. 저 당에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구조의 연료가 됐다는 신호다.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배신한 개인이 아니라 배신을 반복 생산하는 구조를 향해. 뱀에게 물리고 나서 더 좋은 뱀을 찾는 건 해법이 아니다. 뱀굴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 뱀굴의 이름이 국민의힘이다.